-
단편고양이는 건들지 마라: 2025 추천작 이성아

 HOME
HOME유대인 극장: 2022 추천작
2022년 제14회 현진건문학상 추천작
해외여행을 하면서 두어 번 정도 혐오 발언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한번은 곱게 생긴 할머니로부터, 한번은 10대 소녀들로부터. 그때 알았다. 혐오의 언어는 번역이 필요 없다는 걸.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10대 백인 소녀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나를 향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나도 가만 있지 않았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욕설을 줄줄이 읊었다. 물론 한국말로. 오해를 살까봐 변명을 하자면, 나는 욕설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어의 찰진 욕설은 나의 흥미로운 채집대상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살 떨리는 모욕이 되는 말이, 진한 애정을 표현하는 말로 둔갑하는 걸 볼 때면 한국말이 신비롭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게 채집해놓은 것이 마침내 진가를 발휘했다. 나는 마치 책을 읽듯이 욕설을 나열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소녀들이 움찔하더니 겁먹은 강아지들처럼 꽁지를 내리고 도망쳤다. 나는 욕 배틀에서 승리한 것처럼 쾌감마저 느꼈지만, 오랫동안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그것이 소설의 씨앗이 되었다.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10대 백인 소녀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나를 향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나도 가만 있지 않았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욕설을 줄줄이 읊었다. 물론 한국말로. 오해를 살까봐 변명을 하자면, 나는 욕설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어의 찰진 욕설은 나의 흥미로운 채집대상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살 떨리는 모욕이 되는 말이, 진한 애정을 표현하는 말로 둔갑하는 걸 볼 때면 한국말이 신비롭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게 채집해놓은 것이 마침내 진가를 발휘했다. 나는 마치 책을 읽듯이 욕설을 나열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소녀들이 움찔하더니 겁먹은 강아지들처럼 꽁지를 내리고 도망쳤다. 나는 욕 배틀에서 승리한 것처럼 쾌감마저 느꼈지만, 오랫동안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그것이 소설의 씨앗이 되었다.
도서관에 갔다가 밤에 돌아왔을 때도 언니는 없었다. 카디건도 그대로였다. 잠깐 들어왔던 흔적도 없었다. 정말 이대로 간 걸까?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휴대폰은 여전히 꺼진 채였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좁은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던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동안 언니와 다녔던 카페와 성당, 광장까지 텅 빈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돌아온 나는 그날 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정말로 갔나? 귀국 날짜가 오늘이었나? 가면 간다는 말도 못 한단 말인가. 마치 내가 쫓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이게 뭔가.
희붐하게 동이 터오는 걸 보고서야 나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렸다. 오후에 눈을 뜬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언니가 오기는 왔었던가? 나는 뭔가에 홀린 듯 밖으로 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니를 찾을 수 없을 거란 생각만 점점 짙어가더니 언니가 왔었다는 사실도 미심쩍었다. 나중에는 내가 뭘 찾아 헤매는지도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중앙역이었다. 언니와 유대인 뮤지엄에 다녀오면서 튤립을 샀던 꽃 가판대에는 어느새 각양각색의 가을 국화가 수북하게 꽂혀있었다. 언니가 식탁 물병에 꽂아둔 튤립이 아직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가판대를 지나 어느 빌딩 앞에서 낯익은 포스터를 부착한 버스를 발견했다. 연극 <유대인 극장>의 포스터였다. 바르샤바 공연 정보를 검색하다가 발견한 연극이었다. 중앙역 부근에서 극장이 있는 스튜디오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공지를 본 기억이 났다. 기진맥진한 상태에 다리도 아팠던 나는 그대로 셔틀버스에 타버렸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다리를 건너더니 비스와강변을 따라 달렸다. 십여 분 정도 달렸을 뿐인데, 주변은 이렇다 할 만한 건물도 없이 황량했다. 버스가 닿은 곳은 예술회관 같은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나왔고 카운터에서 티켓을 구입하자 옆으로 난 입구를 가리켰다. 문을 열고 두꺼운 휘장을 들치자 매캐한 먼지 냄새가 났다. 천장이 높은 대형 창고처럼 휑뎅그렁하고 어둑한 실내에 스모그가 희뿌옇게 퍼져있었다.
희미한 조명에 의지해서 시야가 트이자 충격적인 장면과 맞닥뜨렸다. 그러니까 휘장을 걷고 들어선 곳이 곧바로 연극무대였다. 무대가 따로 없는 연극이었다. 넓은 공간 한쪽 끝에 완전 나체의 젊은 여자가, 반대쪽 끝에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마주 보며 서 있었다.
희붐하게 동이 터오는 걸 보고서야 나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렸다. 오후에 눈을 뜬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언니가 오기는 왔었던가? 나는 뭔가에 홀린 듯 밖으로 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니를 찾을 수 없을 거란 생각만 점점 짙어가더니 언니가 왔었다는 사실도 미심쩍었다. 나중에는 내가 뭘 찾아 헤매는지도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중앙역이었다. 언니와 유대인 뮤지엄에 다녀오면서 튤립을 샀던 꽃 가판대에는 어느새 각양각색의 가을 국화가 수북하게 꽂혀있었다. 언니가 식탁 물병에 꽂아둔 튤립이 아직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가판대를 지나 어느 빌딩 앞에서 낯익은 포스터를 부착한 버스를 발견했다. 연극 <유대인 극장>의 포스터였다. 바르샤바 공연 정보를 검색하다가 발견한 연극이었다. 중앙역 부근에서 극장이 있는 스튜디오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공지를 본 기억이 났다. 기진맥진한 상태에 다리도 아팠던 나는 그대로 셔틀버스에 타버렸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다리를 건너더니 비스와강변을 따라 달렸다. 십여 분 정도 달렸을 뿐인데, 주변은 이렇다 할 만한 건물도 없이 황량했다. 버스가 닿은 곳은 예술회관 같은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나왔고 카운터에서 티켓을 구입하자 옆으로 난 입구를 가리켰다. 문을 열고 두꺼운 휘장을 들치자 매캐한 먼지 냄새가 났다. 천장이 높은 대형 창고처럼 휑뎅그렁하고 어둑한 실내에 스모그가 희뿌옇게 퍼져있었다.
희미한 조명에 의지해서 시야가 트이자 충격적인 장면과 맞닥뜨렸다. 그러니까 휘장을 걷고 들어선 곳이 곧바로 연극무대였다. 무대가 따로 없는 연극이었다. 넓은 공간 한쪽 끝에 완전 나체의 젊은 여자가, 반대쪽 끝에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마주 보며 서 있었다.
1998년 『내일을 여는 작가』에 단편 「미오의 나라」로 작품활동 시작.
장편소설 『밤이여 오라』, 『가마우지는 왜 바다로 갔을까』, 『경성을 쏘다』
소설작품집 『태풍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요』, 『절정』 등
제주4.3평화문학상, 세계일보문학상 우수상, 이태준문학상 수상.
i-stellah@hanmail.net
유대인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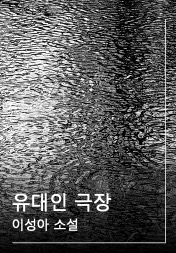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