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안함엄창석 소설집 엄창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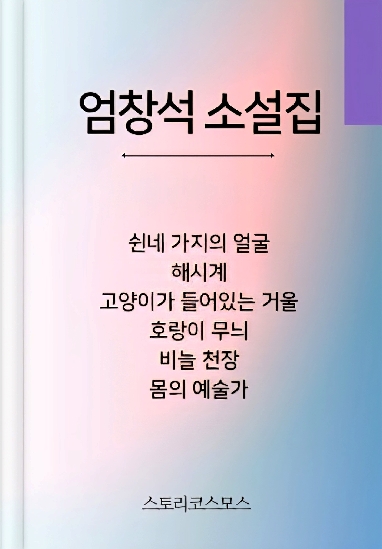
 HOME
HOME전통적인 소설의 습성은 나를 지루하게 한다. 이야기를 둘러싼 삶의 현상과 아름다운 반향들, 완곡한 플롯, 안개처럼 흐르는 문장의 숨결. 이런 소설이, 소설의 미학성을 드러내고, 독자에게 울림을 준다고 하지만 나로선 지루하게 느껴진다. 내 성격이다.
나는 바로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가령, 사과를 사려고 청과물 가게로 가서 흥정하거나 이것저것 빛깔을 고르지 않는다. 곧장 하나만 들고 냅다 튀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도 문학의 오랜 주제인 ‘존재’에 대해서 직접 말해버렸다.
나는 바로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가령, 사과를 사려고 청과물 가게로 가서 흥정하거나 이것저것 빛깔을 고르지 않는다. 곧장 하나만 들고 냅다 튀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도 문학의 오랜 주제인 ‘존재’에 대해서 직접 말해버렸다.
낮 동안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원고 뭉치를 들여다보곤 했다. 우태희에게 전화를 건 건 잠복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째였다. 김위승은 마지막 장에서 사라진 범인을 더 이상 표현해낼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우태희는 낮잠을 자고 있었던 듯 횡설수설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흐흐, 없는 범인을 어떻게 표현하겠누? 나도 자네가 간 뒤로 미궁 속에 숨은 자에 대해 곰곰 생각해보았는데, 이런 게 떠올라.”
담배를 피워 무는 소리가 들린 뒤 그의 말이 이어졌다.
“음…… 앨런 포의 소설 중에 「검은 고양이」란 작품이 있지? 거기 보면, 벽 안에 갇혀 있다가 느닷없이 울음을 우는 고양이가 나오잖아? 뭐라 정리하기 곤란하지만 미궁 속의 범인이란 말에서 벽 속에 있는 검은 고양이라는 이미지가 그려져.”
“검은 고양이?”
김위승은 의외의 말에 잠시 소설의 그 장면을 떠올렸다. 살해한 시체와 함께 벽 속에 넣어진 그 고양이는 피살자와 동질이지만 그로 인해 행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범인의 일부이기도 했다. 우태희의 말은 범인이 검은 고양이처럼 벽 속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뜻이었다. 김위승은 곧장 의문을 표시했다.
“만약 그때 고양이가 울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때마침 벽 속에서 고양이가 울었기 때문에 범인은 드러났고 그 소설도 끝을 맺을 수 있었다.
“울지 않으면 여전히 유보된 상태이겠지. 유보가 지속되는 건 천형(天刑)처럼 무거운 게 아닐까. 검은 고양이처럼 벽 속에서 피살자의 썩는 냄새를 계속 맡아야 하니……”
“그럴까? 후각은 빠르게 마비되네. 이미 자신의 형질도 변형되지 않았겠는가. 결코 무겁지 않을 거야.”
“흐흐, 없는 범인을 어떻게 표현하겠누? 나도 자네가 간 뒤로 미궁 속에 숨은 자에 대해 곰곰 생각해보았는데, 이런 게 떠올라.”
담배를 피워 무는 소리가 들린 뒤 그의 말이 이어졌다.
“음…… 앨런 포의 소설 중에 「검은 고양이」란 작품이 있지? 거기 보면, 벽 안에 갇혀 있다가 느닷없이 울음을 우는 고양이가 나오잖아? 뭐라 정리하기 곤란하지만 미궁 속의 범인이란 말에서 벽 속에 있는 검은 고양이라는 이미지가 그려져.”
“검은 고양이?”
김위승은 의외의 말에 잠시 소설의 그 장면을 떠올렸다. 살해한 시체와 함께 벽 속에 넣어진 그 고양이는 피살자와 동질이지만 그로 인해 행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범인의 일부이기도 했다. 우태희의 말은 범인이 검은 고양이처럼 벽 속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뜻이었다. 김위승은 곧장 의문을 표시했다.
“만약 그때 고양이가 울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때마침 벽 속에서 고양이가 울었기 때문에 범인은 드러났고 그 소설도 끝을 맺을 수 있었다.
“울지 않으면 여전히 유보된 상태이겠지. 유보가 지속되는 건 천형(天刑)처럼 무거운 게 아닐까. 검은 고양이처럼 벽 속에서 피살자의 썩는 냄새를 계속 맡아야 하니……”
“그럴까? 후각은 빠르게 마비되네. 이미 자신의 형질도 변형되지 않았겠는가. 결코 무겁지 않을 거야.”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화살과 구도」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소설집 『슬픈 열대』,『황금색 발톱』,『비늘 천장』, 장편소설 『빨간 염소들의 거리』, 『태를 기른 형제들』,『어린 연금술사』,『유혹의 형식』, 산문집 『개츠비의 꿈』이 있다. 한무숙문학상 수상.
padong22@hanmail.net
고양이가 들어있는 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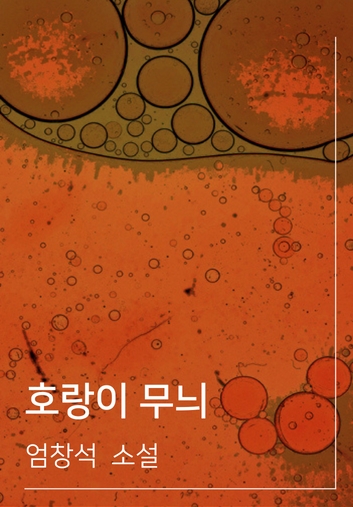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