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안함엄창석 소설집 엄창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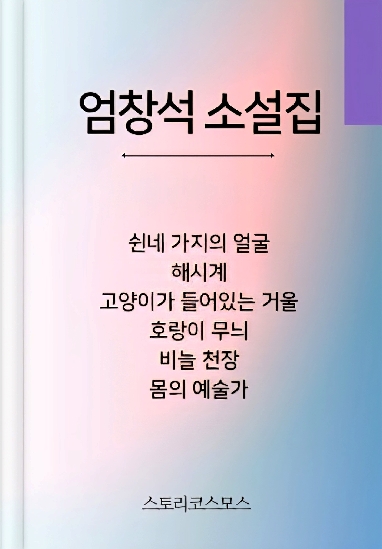
 HOME
HOME이 소설은 나의 단편으로서는 드물게 자전적이다.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다. 심리적으로 주인공과 같다고 느끼는 것이다.
작품을 쓰던 40대 초반, 외로움과 끝 모를 방기, 그것이 주는 속수무책의 슬픔. 어느 정도 감정의 과잉이 있었겠지만, 나는 진실하게 나 자신을 좇아갔다.
그래서 이 소설은 조금 특이한 위치에 놓여 있고, 지금도 매우 좋아한다.
작품을 쓰던 40대 초반, 외로움과 끝 모를 방기, 그것이 주는 속수무책의 슬픔. 어느 정도 감정의 과잉이 있었겠지만, 나는 진실하게 나 자신을 좇아갔다.
그래서 이 소설은 조금 특이한 위치에 놓여 있고, 지금도 매우 좋아한다.
십수 년 전인 열아홉 살 때였다. 동대문에 있는 나이트클럽 내실에서 등에 사슴을 그려 넣던 기억이 아슴아슴 되살아났다. 동년배 녀석들이 다들 용이나 뱀, 호랑이 따위를 그렸을 때 그는 엉뚱하게 사슴을 살갗에 넣어달라고 했다. 먹물을 든 여자는 엘크나 순록 같은 대형사슴이 아니라 고라니처럼 조그마한 놈을 그렸다. 상관은 없었다. 주먹만 흔들며 사는 녀석들과 다르면 되었다. 결국 그렇게 돼버린 셈이었다. 감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패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도 아니고, 십여 년을 도망만 치며 살았으니까.
금희가 샤워기를 들고 등에다 물을 뿌렸다. 아득히 멀어졌던 정신이 퍼뜩 깨어났다. 그녀가 비누 거품을 묻힌 손으로 등을 만졌다. 김을룡은 그녀의 손끝이 어느 부위에 닿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사슴의 다리를 만지고 가슴을 쓸었다. 까만 눈망울과 뾰족한 귓바퀴를 따라 손톱이 가는 선을 그렸다.
김을룡은 간지러우면서 왠지 흥분이 되었다. 나중에는 손가락이 대이기만 해도 오싹오싹 전율이 일었다. 그는 정말 성감대가 자극받듯이 아프고 힘이 들었다. 박이 안마시술소에서 웃옷을 벗고 만 까닭도 여기에 있었나. 오랫동안 그가 그랬던 것처럼, 박도 어느덧 등에다 자신의 감정을 새기고 있었던 게 아닌지.
술에 취한 그녀가 뒤에서 그를 껴안았다. 등에 얼굴을 마구 비비며 울먹였다.
“사슴아, 밖으로 나와라. 마음 놓고 뛰어다녀.”
마치 그녀의 명령이 사실인 것처럼, 등에서 둥둥둥둥 발을 내딛는 소리가 들렸다.
금희가 샤워기를 들고 등에다 물을 뿌렸다. 아득히 멀어졌던 정신이 퍼뜩 깨어났다. 그녀가 비누 거품을 묻힌 손으로 등을 만졌다. 김을룡은 그녀의 손끝이 어느 부위에 닿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사슴의 다리를 만지고 가슴을 쓸었다. 까만 눈망울과 뾰족한 귓바퀴를 따라 손톱이 가는 선을 그렸다.
김을룡은 간지러우면서 왠지 흥분이 되었다. 나중에는 손가락이 대이기만 해도 오싹오싹 전율이 일었다. 그는 정말 성감대가 자극받듯이 아프고 힘이 들었다. 박이 안마시술소에서 웃옷을 벗고 만 까닭도 여기에 있었나. 오랫동안 그가 그랬던 것처럼, 박도 어느덧 등에다 자신의 감정을 새기고 있었던 게 아닌지.
술에 취한 그녀가 뒤에서 그를 껴안았다. 등에 얼굴을 마구 비비며 울먹였다.
“사슴아, 밖으로 나와라. 마음 놓고 뛰어다녀.”
마치 그녀의 명령이 사실인 것처럼, 등에서 둥둥둥둥 발을 내딛는 소리가 들렸다.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화살과 구도」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소설집 『슬픈 열대』,『황금색 발톱』,『비늘 천장』, 장편소설 『빨간 염소들의 거리』, 『태를 기른 형제들』,『어린 연금술사』,『유혹의 형식』, 산문집 『개츠비의 꿈』이 있다. 한무숙문학상 수상.
padong22@hanmail.net
쉰네 가지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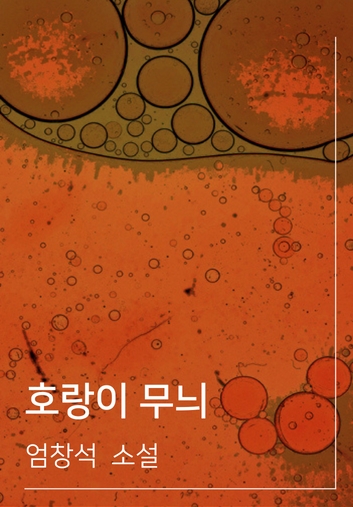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