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안함엄창석 소설집 엄창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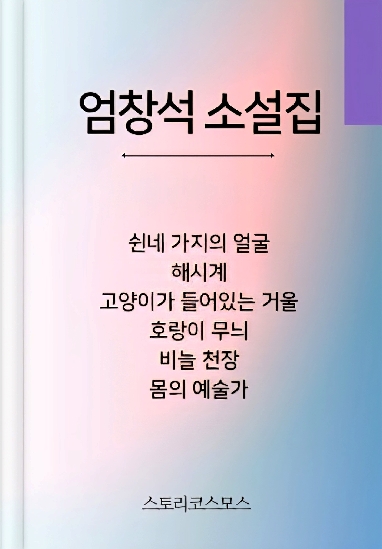
 HOME
HOME나는 글을 쓸 때 ‘구성비’라는 것을 늘 생각한다. 도형의 분할에서 ‘황금비율’라는 것이 있듯이 말이다. 적절한 구성비에 의해 독자가 안정적으로 얘기 속으로 빨려든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몸의 예술가’의 구성비는 몹시 이상하다.
절반씩, 50%씩 딱 나뉜 구성. 이런 위험스럽고도 작위적인 구성이 ‘전통적 구성법’ 이전의 것인지 이후의 것인지 모르겠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새엄마 찬양』을 제외하곤 같은 예를 보지 못했다.
하여간 이 소설이 아니었으면 구성 방법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 덧붙이자면, 이 소설은 광대의 죽음을 다룬 카프카의 「단식광대」와 문명의 종언을 다룬 오스발트 슈펭글러의 『서구의 몰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밝힌다.
절반씩, 50%씩 딱 나뉜 구성. 이런 위험스럽고도 작위적인 구성이 ‘전통적 구성법’ 이전의 것인지 이후의 것인지 모르겠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새엄마 찬양』을 제외하곤 같은 예를 보지 못했다.
하여간 이 소설이 아니었으면 구성 방법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 덧붙이자면, 이 소설은 광대의 죽음을 다룬 카프카의 「단식광대」와 문명의 종언을 다룬 오스발트 슈펭글러의 『서구의 몰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밝힌다.
쇼킹 운운하면서 내 속내는 의뭉스러운 곳을 헤집고 있었다. 사회체제가 서구형으로 바뀐 뒤 으레 넘쳐날 수밖에 없는 뒷골목 유희 같은 것을 떠올렸다. 유럽의 다채로운 역사라는 것도 시큰둥한 건 사실이었다. 수백 년 수천 년 된 유물들이란 따지고 보면 헛간의 거미줄처럼 구질구질하지 않나 싶었다. 새로운 체제가 급박하게 휘몰아쳤으니만큼 진흙탕 속에서처럼 허우적거리고 있을 사람들의 모습이 케케묵은 유물보다 훨씬 서늘한 진실을 보여줄 것 같았다.
유인성은 내 말뜻을 어떻게 짐작했는지 좀 전에 우리에게 커피를 판 여자에게 뭐라 한참 체코 말로 지껄였다. 녀석은 생각보다 훨씬 능숙하게 본토어를 구사했다. 억센 자음 사이로 바람 빠지는 듯한 단모음이 교묘히 뒤섞였다. 여자는 동양인의 입에서 나온 자기 나라말이 신기한 듯 빤히 유인성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풍성한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겨드랑이를 조금 노출시키곤, 옆에 있는 남자 노점상에게 다가가 유인성의 얘기를 전하는 시늉을 했다.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듯 남자는 거푸 고개를 끄떡였다. 기념품을 파는 그 노점상은 콧수염과 눈썹이 짙은 전형적인 체코인이었다.
그는 손동작을 크게 하며 유인성에게 뭐라 대답했다. 유인성은 하 하며 짧게 탄성을 내질렀다. 잔뜩 기대에 찬 눈길을 던지는 내게 대뜸 이렇게 말했다.
“너, 서커스 한번 볼래?”
“무어? 겨우 서커스냐, 여기까지 와서?”
“서양 서커스는 우리나라랑 달라. 규모가 웅장하고 기술이 고난도야. 아주 기괴한 것을 구경거리로 삼기도 해. 너 혹시 단식광대란 말 들어봤냐?”
“단식광대?”
“인간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서커스가 있어. 어떠냐, 한번 가볼래? 나도 진작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짜식, 너네 강아지나 데려가라 인마. 야, 어디 가서 맥주나 한잔 해.”
유인성은 내 말뜻을 어떻게 짐작했는지 좀 전에 우리에게 커피를 판 여자에게 뭐라 한참 체코 말로 지껄였다. 녀석은 생각보다 훨씬 능숙하게 본토어를 구사했다. 억센 자음 사이로 바람 빠지는 듯한 단모음이 교묘히 뒤섞였다. 여자는 동양인의 입에서 나온 자기 나라말이 신기한 듯 빤히 유인성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풍성한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겨드랑이를 조금 노출시키곤, 옆에 있는 남자 노점상에게 다가가 유인성의 얘기를 전하는 시늉을 했다.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듯 남자는 거푸 고개를 끄떡였다. 기념품을 파는 그 노점상은 콧수염과 눈썹이 짙은 전형적인 체코인이었다.
그는 손동작을 크게 하며 유인성에게 뭐라 대답했다. 유인성은 하 하며 짧게 탄성을 내질렀다. 잔뜩 기대에 찬 눈길을 던지는 내게 대뜸 이렇게 말했다.
“너, 서커스 한번 볼래?”
“무어? 겨우 서커스냐, 여기까지 와서?”
“서양 서커스는 우리나라랑 달라. 규모가 웅장하고 기술이 고난도야. 아주 기괴한 것을 구경거리로 삼기도 해. 너 혹시 단식광대란 말 들어봤냐?”
“단식광대?”
“인간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서커스가 있어. 어떠냐, 한번 가볼래? 나도 진작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짜식, 너네 강아지나 데려가라 인마. 야, 어디 가서 맥주나 한잔 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화살과 구도」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소설집 『슬픈 열대』,『황금색 발톱』,『비늘 천장』, 장편소설 『빨간 염소들의 거리』, 『태를 기른 형제들』,『어린 연금술사』,『유혹의 형식』, 산문집 『개츠비의 꿈』이 있다. 한무숙문학상 수상.
padong22@hanmail.net
몸의 예술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1 | 오묘하고 서늘한 이야기 | 유안 | 2023-04-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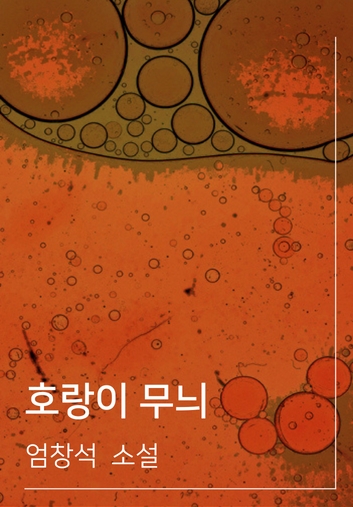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