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안함엄창석 소설집 엄창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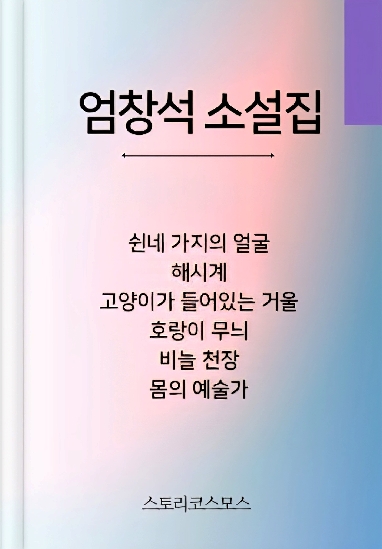
 HOME
HOME어느 날 형이 큰일났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밭에서 동면하는 뱀을 주워와서 아파트에 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뱀이 동면에서 깨어나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몇 시간을 뒤졌는데도 온데간데없다는 것이다.
“이거 소설거리 아니야? 나야 죽을 맛이지만.”
소설로 써보라는 것이다.
“그게 뭐 소설이 된다고. 내가 뭐 가십 기자냐?”
나는 형의 안목을 비아냥댔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형의 직관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파트에 숨어버린, 호랑이 무늬가 그어진 칠점사(물린 사람이 일곱 걸음을 떼기 전에 죽는다는 독사)가 풍부한 은유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밭에서 동면하는 뱀을 주워와서 아파트에 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뱀이 동면에서 깨어나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몇 시간을 뒤졌는데도 온데간데없다는 것이다.
“이거 소설거리 아니야? 나야 죽을 맛이지만.”
소설로 써보라는 것이다.
“그게 뭐 소설이 된다고. 내가 뭐 가십 기자냐?”
나는 형의 안목을 비아냥댔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형의 직관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파트에 숨어버린, 호랑이 무늬가 그어진 칠점사(물린 사람이 일곱 걸음을 떼기 전에 죽는다는 독사)가 풍부한 은유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무엇이지?
쥐인가, 쥐가 아니라 뱀이었다. 꿈결인지, 환영인지, 화살촉 같은 머리를 치켜들고 뱀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다. 푸르고 붉은 비늘이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게 낱낱이 보였다. 뱀들은 어디선지 끝없이 나타났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젖힌 상태였고 솨아아 솨아아, 뱀들은 긴 에스 자를 그으며 소파 밑을 에워싸고 있었다.
“엇, 이놈이 천장에 올라갔을지 모르겠네?”
잠을 잤던가. 그동안 뱀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천장으로 올라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이 번쩍 떠졌다. 지금껏 바닥만 뒤졌지 한 번도 벽이나 천장 쪽을 살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벽과 천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는 물건들은 굉장히 많았다. 게다가 숨을 만한 장소도 적지 않았다. 책장만 해도 칸이 여섯 개가 아닌가.
나는 후다닥 일어나 피아노 책장 문갑 따위를 뒤적여 나갔다. 가구들이 방 복판으로 밀려나와 있어 공간이 비좁았다. 어깨를 세워 옷걸이와 책장 틈을 마구 뒤적이던 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뱀이 갑자기 위에서 떨어져 내 목덜미에 이빨을 박을 것만 같았다.
나는 고래고래 욕지거리를 하며 옷장 문을 열어젖혔다. 후들거리는 손으로 캡이 달린 두터운 파카 옷을 꺼냈다. 팔을 꿰려다 말고 옷을 벽에다 대고 탁탁 털었다. 옷을 털 때 금연담배 파이프가 튀어나왔는데 뱀인 줄 알고 까무러칠 뻔했다.
나는 겨울 파카 옷을 입고 방을 돌아다니며 큰방 옷걸이와 서랍장, 책꽂이를 미친 듯이 손으로 헤쳤다. 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뱀이 목을 뻗어 내 팔뚝을 물 것 같은 공포심과 싸우는 중이었다. 그 통에 딸아이의 책상 위나 아내의 화장대도 한순간에 헝클어졌다. 체스 말처럼 화장품을 정리했던 그저께의 일은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공포와 얼마나 싸웠을까. 주방의 수납장을 뒤적이던 나는 끼고 있던 장갑을 뽑아 개수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뒤꿈치를 문지방에 쳐서 등산화를 벗겼다. 발로 차듯 신발을 현관으로 던졌다. 현관문 유리가 부서질 듯 비명을 질렀다. 파카도 훌훌 벗었다. 조금도 춥지 않았다. 가슴에서 열기가 펄펄 쏟아졌다. 내 목덜미에 떨어지기만 하면 맨손으로 잡아 엿가락처럼 땅겨버리리라. 시퍼런 살기가 일었다. 나는 눈을 부릅뜬 채 방 복판에 쌓아둔 책과 이불의 틈새로 맨손을 푹푹 찔러 넣었다.
어느새 창밖으로 희붐한 빛이 감돌았다. 101단지 위 동편 하늘에 푸른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에 섞여 무수한 소음이, 비바람 치듯 쏟아져 들어왔다.
쥐인가, 쥐가 아니라 뱀이었다. 꿈결인지, 환영인지, 화살촉 같은 머리를 치켜들고 뱀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다. 푸르고 붉은 비늘이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게 낱낱이 보였다. 뱀들은 어디선지 끝없이 나타났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젖힌 상태였고 솨아아 솨아아, 뱀들은 긴 에스 자를 그으며 소파 밑을 에워싸고 있었다.
“엇, 이놈이 천장에 올라갔을지 모르겠네?”
잠을 잤던가. 그동안 뱀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천장으로 올라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이 번쩍 떠졌다. 지금껏 바닥만 뒤졌지 한 번도 벽이나 천장 쪽을 살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벽과 천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는 물건들은 굉장히 많았다. 게다가 숨을 만한 장소도 적지 않았다. 책장만 해도 칸이 여섯 개가 아닌가.
나는 후다닥 일어나 피아노 책장 문갑 따위를 뒤적여 나갔다. 가구들이 방 복판으로 밀려나와 있어 공간이 비좁았다. 어깨를 세워 옷걸이와 책장 틈을 마구 뒤적이던 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뱀이 갑자기 위에서 떨어져 내 목덜미에 이빨을 박을 것만 같았다.
나는 고래고래 욕지거리를 하며 옷장 문을 열어젖혔다. 후들거리는 손으로 캡이 달린 두터운 파카 옷을 꺼냈다. 팔을 꿰려다 말고 옷을 벽에다 대고 탁탁 털었다. 옷을 털 때 금연담배 파이프가 튀어나왔는데 뱀인 줄 알고 까무러칠 뻔했다.
나는 겨울 파카 옷을 입고 방을 돌아다니며 큰방 옷걸이와 서랍장, 책꽂이를 미친 듯이 손으로 헤쳤다. 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뱀이 목을 뻗어 내 팔뚝을 물 것 같은 공포심과 싸우는 중이었다. 그 통에 딸아이의 책상 위나 아내의 화장대도 한순간에 헝클어졌다. 체스 말처럼 화장품을 정리했던 그저께의 일은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공포와 얼마나 싸웠을까. 주방의 수납장을 뒤적이던 나는 끼고 있던 장갑을 뽑아 개수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뒤꿈치를 문지방에 쳐서 등산화를 벗겼다. 발로 차듯 신발을 현관으로 던졌다. 현관문 유리가 부서질 듯 비명을 질렀다. 파카도 훌훌 벗었다. 조금도 춥지 않았다. 가슴에서 열기가 펄펄 쏟아졌다. 내 목덜미에 떨어지기만 하면 맨손으로 잡아 엿가락처럼 땅겨버리리라. 시퍼런 살기가 일었다. 나는 눈을 부릅뜬 채 방 복판에 쌓아둔 책과 이불의 틈새로 맨손을 푹푹 찔러 넣었다.
어느새 창밖으로 희붐한 빛이 감돌았다. 101단지 위 동편 하늘에 푸른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에 섞여 무수한 소음이, 비바람 치듯 쏟아져 들어왔다.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화살과 구도」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소설집 『슬픈 열대』,『황금색 발톱』,『비늘 천장』, 장편소설 『빨간 염소들의 거리』, 『태를 기른 형제들』,『어린 연금술사』,『유혹의 형식』, 산문집 『개츠비의 꿈』이 있다. 한무숙문학상 수상.
padong22@hanmail.net
호랑이 무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1 | 재밌어요. 긴박감 최고 | May | 2024-05-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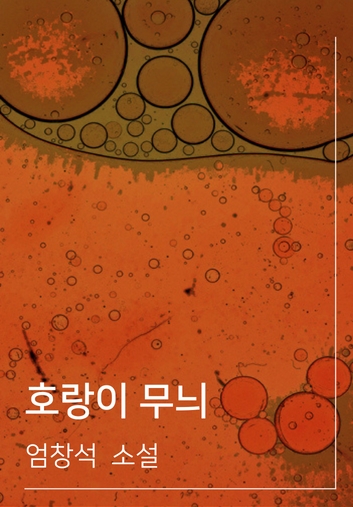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