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안함엄창석 소설집 엄창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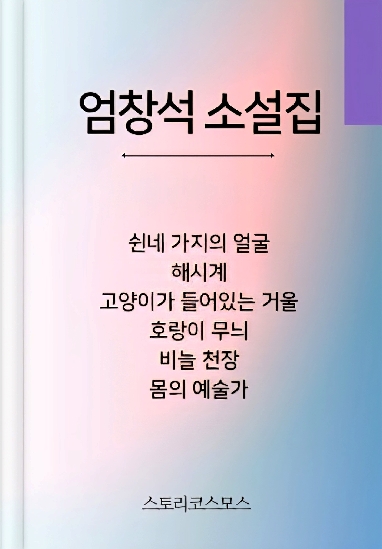
 HOME
HOME이탈로 칼비노, 오르한 파묵 같은 작가들의 소설을 읽으면서 나도 옛것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쓰고 싶었다. ‘한국의 작가’이니만큼 우리 옛것으로 된 소설 한 권쯤은 가져야겠지, 하고 생각했다. 다만, 소설문학이 서양 근대의 산물이라서 그들의 작품은 여전히 근대성을 구가할 수 있었던 반면에 우리의 옛날은 근대적이지 않아 소설문학과 어울리기 힘들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근대 이전의 이야기를 현대의 문제로 끌고 와서 작품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단편 7편을 묶어 단행본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 근대 이전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첫 번째가 「해시계」였고, 두 번째가 「비늘 천장」이다.
마치 이 시리즈를 완성해야 ‘한국의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듯이 제법 치열하게 쓴 것 같다.
나는 이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쓰게 될 남은 다섯 편의 단편들이 머릿속에 충일하게 차오르는 행복을 맛보았지만, 완성을 못 했다. 힘이 빠지고 말았다. 모든 건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기 ‘작가의 말’을 쓰는 동안 남은 행로를 계속해야겠다는 가열찬 욕망을 느낀다.
나는 근대 이전의 이야기를 현대의 문제로 끌고 와서 작품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단편 7편을 묶어 단행본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 근대 이전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첫 번째가 「해시계」였고, 두 번째가 「비늘 천장」이다.
마치 이 시리즈를 완성해야 ‘한국의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듯이 제법 치열하게 쓴 것 같다.
나는 이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쓰게 될 남은 다섯 편의 단편들이 머릿속에 충일하게 차오르는 행복을 맛보았지만, 완성을 못 했다. 힘이 빠지고 말았다. 모든 건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기 ‘작가의 말’을 쓰는 동안 남은 행로를 계속해야겠다는 가열찬 욕망을 느낀다.
땅거미가 질 때까지 방사 앞에서 기다렸으나 복인춘은 나타나지 않았다. 인부들도 대개 집으로 돌아간 듯했다. 복인춘은 나오지 않고 도리어 그동안 보지 못한 낯선 사람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수염이 부슬부슬한 중늙은이들 틈에 턱밑이 고운 젊은 청년까지 끼어 있었다. 도포자락을 휘두르듯 걷고 있었으나 정제되지 않은 의복에서 양반을 흉내 내는 중인 같은 인상을 풍겼다. 한둘은 양반의 비뚤어진 자제이던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질 즈음 나도 방사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뜰에는 이미 판목과 인쇄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고 늙은이 하나가 남은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 늙은이의 말을 듣고 대청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해괴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방문을 열자 연초 연기에 숨이 컥 막혔는데, 손으로 연기를 휘휘 내젓는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투전판이었다. 다섯 사람이 둘러앉아 골패를 잡고 있었다. 거기에 엉덩이가 펑퍼짐한 복인춘도 같이 있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작은 술상 앞에 앉은 계집이었다. 속치마가 비치도록 다리를 세우고 앉아 패가 없는 사내들과 맞희롱을 하고 있었다. 복인춘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상투머리를 숙인 채 패를 겨눠보면서 연신 술트림을 해댔다.
활자 보관함에 등을 기댄 투전패 하나가 장죽을 뻐끔대며 질퍽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갓을 등에 늘어뜨린 젊은 아이는 계집 옆구리에 팔을 두르고 아주 농탕질이었다. 가슴을 풀어헤친 복인춘이 골패를 손등에 탁탁 치고는 엽전을 내던졌다.
계집이 헤실헤실 웃음을 날리며 내게 무슨 말을 건넸을 때 나는 비틀거리며 방을 빠져나왔다. 어이가 없었다. 지장과 각자장을 두루 거치고 이윽고 책의 제작을 감독하는 사감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가 이곳을 투전판으로 만들다니. 작부까지 데려와서는.
“잠잘 곳에 없어서 온 건가. 오라, 노잣돈이 떨어진 게로군. 어이, 오 서방, 끝방 비었으면 이 어른에게 내어주게나.”
내가 허둥지둥 댓돌로 내려서는데 방에서 빈정대는 복인춘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알 수 없는 것은 내 자신이었다.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야겠지만 나는 무슨 자력에 끌린 듯 주인이 내주는 옆채로 들어가고 말았다. 모멸감도 지독해지면 사람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인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질 즈음 나도 방사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뜰에는 이미 판목과 인쇄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고 늙은이 하나가 남은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 늙은이의 말을 듣고 대청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해괴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방문을 열자 연초 연기에 숨이 컥 막혔는데, 손으로 연기를 휘휘 내젓는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투전판이었다. 다섯 사람이 둘러앉아 골패를 잡고 있었다. 거기에 엉덩이가 펑퍼짐한 복인춘도 같이 있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작은 술상 앞에 앉은 계집이었다. 속치마가 비치도록 다리를 세우고 앉아 패가 없는 사내들과 맞희롱을 하고 있었다. 복인춘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상투머리를 숙인 채 패를 겨눠보면서 연신 술트림을 해댔다.
활자 보관함에 등을 기댄 투전패 하나가 장죽을 뻐끔대며 질퍽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갓을 등에 늘어뜨린 젊은 아이는 계집 옆구리에 팔을 두르고 아주 농탕질이었다. 가슴을 풀어헤친 복인춘이 골패를 손등에 탁탁 치고는 엽전을 내던졌다.
계집이 헤실헤실 웃음을 날리며 내게 무슨 말을 건넸을 때 나는 비틀거리며 방을 빠져나왔다. 어이가 없었다. 지장과 각자장을 두루 거치고 이윽고 책의 제작을 감독하는 사감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가 이곳을 투전판으로 만들다니. 작부까지 데려와서는.
“잠잘 곳에 없어서 온 건가. 오라, 노잣돈이 떨어진 게로군. 어이, 오 서방, 끝방 비었으면 이 어른에게 내어주게나.”
내가 허둥지둥 댓돌로 내려서는데 방에서 빈정대는 복인춘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알 수 없는 것은 내 자신이었다.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야겠지만 나는 무슨 자력에 끌린 듯 주인이 내주는 옆채로 들어가고 말았다. 모멸감도 지독해지면 사람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인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화살과 구도」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소설집 『슬픈 열대』,『황금색 발톱』,『비늘 천장』, 장편소설 『빨간 염소들의 거리』, 『태를 기른 형제들』,『어린 연금술사』,『유혹의 형식』, 산문집 『개츠비의 꿈』이 있다. 한무숙문학상 수상.
padong22@hanmail.net
비늘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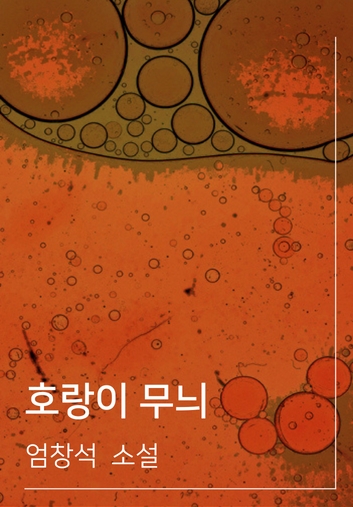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