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연기를 위한 연기를 위하여 방성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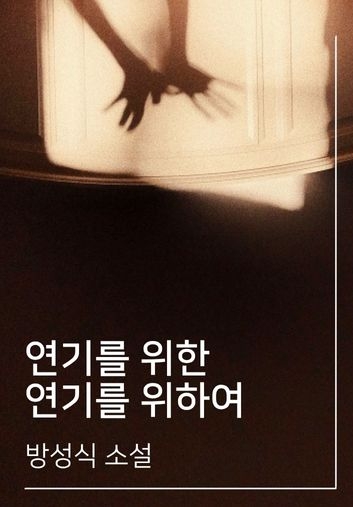
 HOME
HOME이런 글은 되도록 쓰지 말자고 다짐했었다. 하나는 작가인 내가 주인공인 소설, 또 하나는 종교와 관련된 소설. 그런 글이 별로거나 부적절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나와 무관한 소설을 썼고, 그걸 작가의 미덕으로 여겼다. 덕분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쾌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구효서 작가의 「깡통 따개가 없는 마을」, 이승우 작가의 「너희가 신처럼」을 읽은 후 내가 주인공으로 나서며 종교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소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이야기는 내 삶의 전반부에 걸친 테마와 연결돼 있어 더 늦기 전에 도전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이 시기의 일들을 곱씹고 곱씹어 되풀이할 테니까.
가끔 미래가 현재를 구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 새운 밤들도, 이 소설의 사건도 누군가 그런 일이 있도록 정해둔 것 같다. 내 인생도, 내가 쓴 소설도 그저 주어진 거라면 선택은 한 가지, 연기를 위해 나의 배역을 연기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구효서 작가의 「깡통 따개가 없는 마을」, 이승우 작가의 「너희가 신처럼」을 읽은 후 내가 주인공으로 나서며 종교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소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이야기는 내 삶의 전반부에 걸친 테마와 연결돼 있어 더 늦기 전에 도전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이 시기의 일들을 곱씹고 곱씹어 되풀이할 테니까.
가끔 미래가 현재를 구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 새운 밤들도, 이 소설의 사건도 누군가 그런 일이 있도록 정해둔 것 같다. 내 인생도, 내가 쓴 소설도 그저 주어진 거라면 선택은 한 가지, 연기를 위해 나의 배역을 연기하는 것뿐이다.
“나는 내 얘기는 안 써. 내 소설은 전부 남들 얘기야.”
내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갑자기 게이가 되거나, 귀신에게 홀려 고생하기도 하고, 돈을 들고 사라진 전 여친을 뒤쫓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게이도 귀신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넉넉하지도 않다. 전부 남의 사연을 소설로 각색한 글이다. 물론 허락을 구한 뒤에.
“작가들의 글은 다 자기 이야기 아냐?”
희수의 질문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글쎄, 적어도 나는 아니야. 나는 개인사는 안 쓰거든.”
“왜? 그게 소설가의 금기 같은 거야?”
“아니야. 그냥 어려워서 그래. 사건을 만들려면 인물의 동기와 행동 유인을 알아야 하는데 나는 나를 잘 모르겠거든. 너도 그럴걸?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할지 알고 있어?”
희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모르지.”
“남의 사연은 쉬워. 이미 완성된 삶과 경험, 욕망을 서사 구조에 맞춰 조립하면 그만이야. 부족한 점은 적당히 지어내도 상관없지. 어차피 소설은 가짜니까.”
아주 기술적인 작업이라는 말에 희수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큰스님이 하시던 말 기억나? 연기를 위한 연기라고.”
내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갑자기 게이가 되거나, 귀신에게 홀려 고생하기도 하고, 돈을 들고 사라진 전 여친을 뒤쫓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게이도 귀신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넉넉하지도 않다. 전부 남의 사연을 소설로 각색한 글이다. 물론 허락을 구한 뒤에.
“작가들의 글은 다 자기 이야기 아냐?”
희수의 질문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글쎄, 적어도 나는 아니야. 나는 개인사는 안 쓰거든.”
“왜? 그게 소설가의 금기 같은 거야?”
“아니야. 그냥 어려워서 그래. 사건을 만들려면 인물의 동기와 행동 유인을 알아야 하는데 나는 나를 잘 모르겠거든. 너도 그럴걸?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할지 알고 있어?”
희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모르지.”
“남의 사연은 쉬워. 이미 완성된 삶과 경험, 욕망을 서사 구조에 맞춰 조립하면 그만이야. 부족한 점은 적당히 지어내도 상관없지. 어차피 소설은 가짜니까.”
아주 기술적인 작업이라는 말에 희수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큰스님이 하시던 말 기억나? 연기를 위한 연기라고.”
2023-1 스토리코스모스 신인소설상 당선
2024 종이책『소설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공저) 출간
장르소설집 『남친을 화분에 담는 방법』, 여행 에세이 『냉정한 여행』 출간
웹북 『현관이 사라진 방』 『채찍들의 축제』 『이별의 미래』『만년필에 대하여』『셸터』『러브체어를 찾아서』 출간
linktr.ee/bbangaa
qkdrntlr15@naver.com
연기를 위한 연기를 위하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1 | 운명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 박은비 | 2025-11-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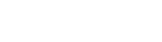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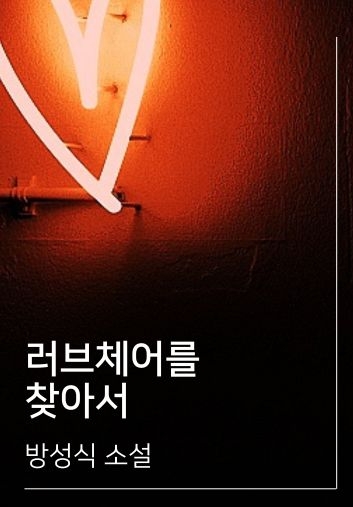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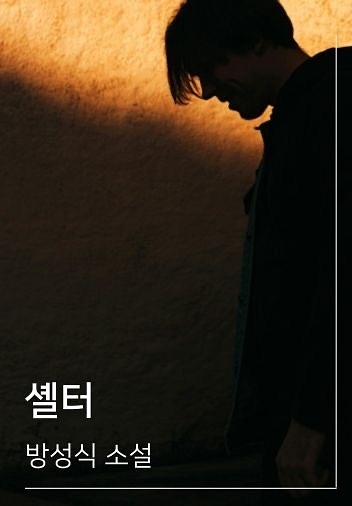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