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호수 명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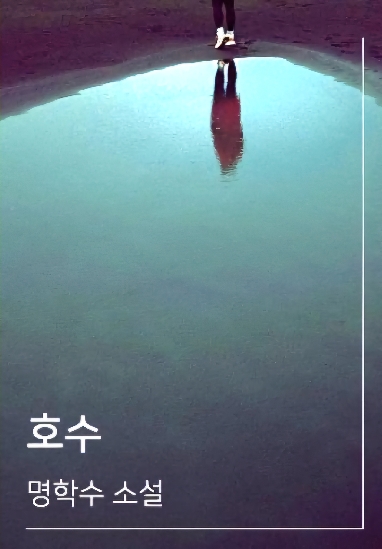
 HOME
HOME소설 <호수>에 대해 저는 어딘가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이것을 쓰는 동안 저는 ‘소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소설이 소설의 기원이라든가, 소설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응답 중 하나로 읽힌다면 더 없이 기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과장된 허풍이었습니다.
<호수>의 초고를 쓰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는 다른 작품을 쓸 때와 달리 아무런 밑그림도 없었고 초점조차 흐릿했습니다. 그저 몇 개의 짧은 이야기와 은유에 대한 집착만이 내 손아귀에 들어 있었고, 나는 그것만으로 어떻게든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호수>와 ‘소설’이라는 관념의 유기체를 서로 연결시킨 건 초고를 완성하고도 수십 번의 퇴고를 거친 후 멀리 밀어두었다가 거의 반 년 만에 다시 꺼내서 마치 타인의 자식을 마주한 듯 무심하게 들여다 본 후였을 겁니다. 어쩌면 <호수>가 ‘소설’의 보조관념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그럴싸한 은유가 되어 내 소설에 문학적인 아우라를 드리웠습니다.
그 때로부터 또 두 해가 지난 지금, 저는 그것이 어설픈 은유임을 압니다.
<호수>는 한 편의 짧은 소설에 불과하고
거기서 무엇을 읽든 그건 읽는 이의 자유일 겁니다.
그러한 자유로움에 취해 호숫가를 떠도는 이야기가 소설 <호수>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더 흐른 후에 <호수>를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르게 읽힐 수도 있겠지요.
소설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이것을 쓰는 동안 저는 ‘소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소설이 소설의 기원이라든가, 소설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응답 중 하나로 읽힌다면 더 없이 기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과장된 허풍이었습니다.
<호수>의 초고를 쓰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는 다른 작품을 쓸 때와 달리 아무런 밑그림도 없었고 초점조차 흐릿했습니다. 그저 몇 개의 짧은 이야기와 은유에 대한 집착만이 내 손아귀에 들어 있었고, 나는 그것만으로 어떻게든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호수>와 ‘소설’이라는 관념의 유기체를 서로 연결시킨 건 초고를 완성하고도 수십 번의 퇴고를 거친 후 멀리 밀어두었다가 거의 반 년 만에 다시 꺼내서 마치 타인의 자식을 마주한 듯 무심하게 들여다 본 후였을 겁니다. 어쩌면 <호수>가 ‘소설’의 보조관념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그럴싸한 은유가 되어 내 소설에 문학적인 아우라를 드리웠습니다.
그 때로부터 또 두 해가 지난 지금, 저는 그것이 어설픈 은유임을 압니다.
<호수>는 한 편의 짧은 소설에 불과하고
거기서 무엇을 읽든 그건 읽는 이의 자유일 겁니다.
그러한 자유로움에 취해 호숫가를 떠도는 이야기가 소설 <호수>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더 흐른 후에 <호수>를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르게 읽힐 수도 있겠지요.
소설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갑시다, 모텔.”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가장 당황한 것은 아마도 나였을 것이다. 이유가 뭐였을까? 그동안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온 중년의 본능이 불쑥 발현되어 내 옆구리를 쿡 찔렀던 것이었을까. 여자의 표정 위에 떠돌던 홍조가 핏빛으로 바뀌는 걸 지켜보며 나는 안면 근육에 힘을 주고 여자의 손바닥이 날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여자는, 풋, 하고 소리 내어 웃었다.
“재밌는 분이네요.”
여자는 몸을 돌려 걸음을 떼었다. 그녀는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갔고 나는 그녀의 뒤를 좇았다. 여자의 발걸음에는 다급함도 방향도 없었다. 그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흐린 하늘이 비쳐 보이는 빗물을 따라서 발을 옮겨 놓았다. 나는 여자가 그대로 큰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렇다 해도 그건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애초에 그녀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나 또한 택시를 타고 다시 리조트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었다.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가장 당황한 것은 아마도 나였을 것이다. 이유가 뭐였을까? 그동안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온 중년의 본능이 불쑥 발현되어 내 옆구리를 쿡 찔렀던 것이었을까. 여자의 표정 위에 떠돌던 홍조가 핏빛으로 바뀌는 걸 지켜보며 나는 안면 근육에 힘을 주고 여자의 손바닥이 날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여자는, 풋, 하고 소리 내어 웃었다.
“재밌는 분이네요.”
여자는 몸을 돌려 걸음을 떼었다. 그녀는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갔고 나는 그녀의 뒤를 좇았다. 여자의 발걸음에는 다급함도 방향도 없었다. 그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흐린 하늘이 비쳐 보이는 빗물을 따라서 발을 옮겨 놓았다. 나는 여자가 그대로 큰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렇다 해도 그건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애초에 그녀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나 또한 택시를 타고 다시 리조트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었다.
201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2020년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선정
2020년 경기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문학분야 우수작가 선정
2020년 9월 소설집 「나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출간
eyaya66@naver.com
호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2 | 소설을 쓴다는 건, 호수를 품고 사는 일 | ams | 2022-06-06 |
| 1 | 호수가 제목이어서 크고 거대한 물 줄기를 떠올렸는데 | 소후 | 2022-04-24 |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