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어쩌면 이 소설을 읽기 전까지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여우인 줄 알았을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 관조 씨와 달리,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과 호기심을 조금은 통제하고,
단포도를 일단 신포도로 규정한 후에는
입맛 몇 번 다시는 정도로 쿨하게 돌아설 줄 아는,
그런 여우쯤으로.
하지만 회사원 관조 씨의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착각도 유분수’라는 말이 절로 입에서 나온다.
작가는 삶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도려내어 내 눈앞에 들이밀며 말한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리하여,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관조 씨와 다를 바 없다.
내 머리에 얹을 잘 생긴 돼지머리를 고르고, (잘 생긴 돼지 머리)
자존심을 자기 정당화하는 데 발휘하고, (모든 신포도 밑에는 여우가 있다)
삶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기면발작 상태에 빠지고, (기면발작증)
무모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결국 타인을 희생시킨다. (자동차의 사랑)
우리는 결국 다 여우다.
한편으로, 관조 씨처럼 세상을 ‘관조’만 하도록 운명 지워졌다는 둥
어쭙잖은 농담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론, 달콤해 보이는 포도송이들 아래서 신음하고 우울해한다.
이 소설의 엔딩처럼,
세상은 굶주린 여우들이 들끓는 포도밭이다.
이런 세상에서
꽤 괜찮은 여우란 존재할 수 있을까.
소설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왠지 그런 여우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좋은 소설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다.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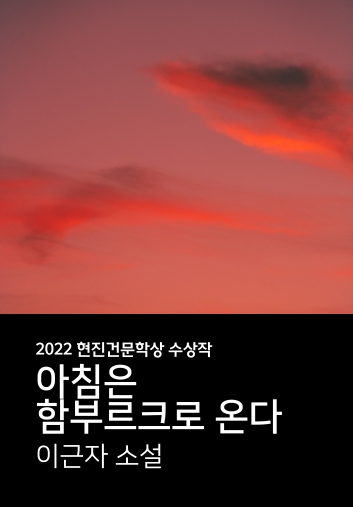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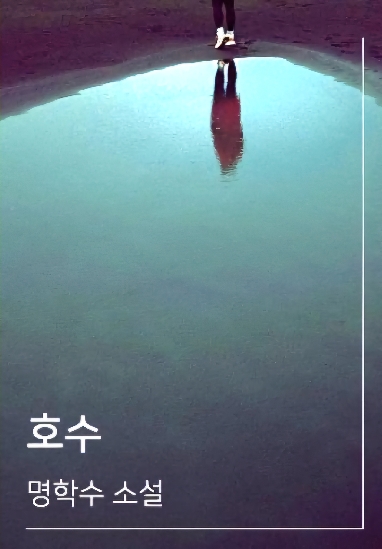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