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문득 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처럼
먹먹한 외로움이 마음을 건드린다.
그 시절을 함께 보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보냈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시인의 시 앞에서 그런 건 의미를 잃는다.
결혼한 여자라면 신혼 방을 기웃거리던 “연적”이 있을 것이고
그녀도 나처럼 “입 다문 저녁”이었고
“홀로 눈발 흩날리는 발등”(사선의 풍경들) 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상도동에서 캘리포니아만큼의 거리”(경화)를 달려서 훌쩍 어른이 되어버린
초등학교 동창도 있을 것이고.
시인은 칠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했다.
“커피공장이 있던 동네”에 살면서
매일 밥 타는 냄새가 난다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다.
골방에서 홀로 여행하는 시인은 외로움을 안다.
그래서 시인에게 매일 밥을 태우는 “낯모르는 사람”은
“외로운 여자”(커피공장이 있던 동네)일 수밖에 없다.
“통속에 누워서도” 시선은 먼 데를 향하고
“이국의 동전들”(통속에 누워)을 만지작거리며 두려움을 달랜다.
“발뒤꿈치 각질을 떼느라“ 열정은 잊혀지고 (하품을 받는 오후)
“우뚝 나로 살았던 날들의 골목과 표정”이 궁금해서
“가끔씩 검색창에 네 이름을 적어보곤” (회화나무에게) 하는 삶은
뭐가 바쁜지도 모르게 바쁘게 흘러서는
이렇듯 우리 앞에 외로움으로 나타난다.
외로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더 애틋하고 그리운 건,
우리 모두가 외롭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시작하는 시인에게
외로운 하늘이 울리도록 박수를 보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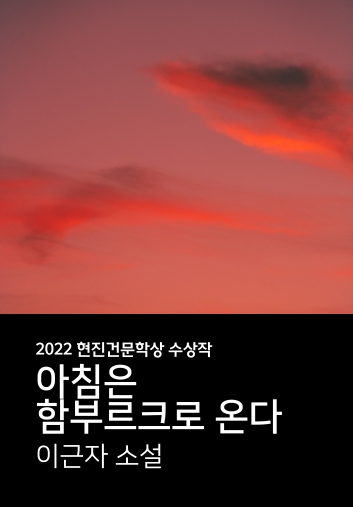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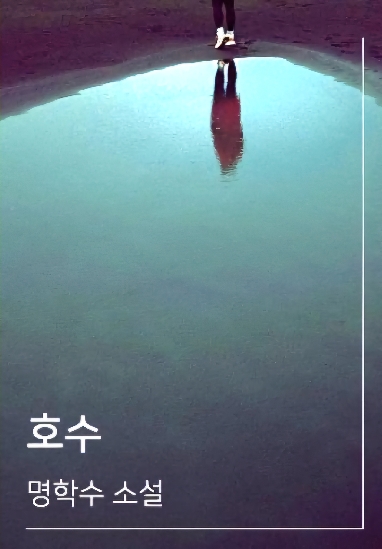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