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그를 위해서라도 그림 같이 푸른 호수는 있어야만 했다.
화자는 일 년 동안 소설 한 줄 못 쓰고 있다.
소설가로서 개점휴업상태다. 한 마디로 망한 거다.
하지만 호수는 없었다.
호수의 이미지와 환상만 있을 뿐이다.
이미지와 환상만으로 어떻게든 이야기는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 ‘폭망’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호수 이야기는 사실인지 지어낸 것인지 알 수 없다.
불분명한 이야기들만 개떼처럼 난무한다.
택시 기사는 이상한 식당으로 가자는 그녀에게
작정하고 한방 먹일 심산으로
시골 동네의 이상한 복수극 이야기를 떠든다.
노인은 오래 전 매립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호수와 청년의 사연을 이야기한다.
화자는 이 두 이야기를 교묘하게 섞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든다.
다행히 ‘폭망’은 면했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게 바로 소설이지, 하는 생각이
호수 이미지에 딸려 온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과 해석은 각기 다르다.
그녀는 다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수선화인데 호수가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술에 취한 건지 뭔지 아무튼 세게 따진다.
그녀는 명민한 독자의 마음을 대변한다.
화자의 꽉 막힌 창작에 구멍을 뚫은 것은
그녀의 검정색 장우산 안으로 뛰어드는 순간일 것이다.
우산은 호수에 가지 않고도 호수를 만나게 해준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우산이 필요하다는 그녀를
화자는 우산 있는 곳의 반대 방향인 무인텔로 잡아끈다.
비가 그쳤으므로 우산은 필요 없다.
하지만 엔딩에서 화자는
빗방울이 떨어져도 우산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자신감을 보인다. 일단 뚫었으니까.
뚫고 들어간 물길을 어떻게 헤어져 갈 것인지는
온전히 소설가인 화자의 몫이 될 터이다.
알몸이 되어 몸을 던진 호수에서
그는 살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처럼 시체로 떠오를지 모른다.
매년 사람들은 호수에 그렇게 몸을 던진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캄캄한 물속으로.
소설 <호수>는 소설을 쓰는 이에게 행운을 빌어준다.
개, 닭, 물고기 말고 아주 다른 것을 상상하기를.
검정색 장우산 속으로 일단 뛰어들기를.
부디, 캄캄한 물속에서 길을 찾기를.
작가는 <호수>를 쓰는 동안 소설을 생각했다고 한다.
작가의 생각을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호수>는 소설을 생각하게 한다.
읽으면서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떠올랐고
무궁무진한 임의의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다.
작가의 말처럼,
세월이 흐른 뒤, 다시 <호수>를 읽으면 그때는 어떨지 장담할 수 없다.
소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작가는 이미 그 답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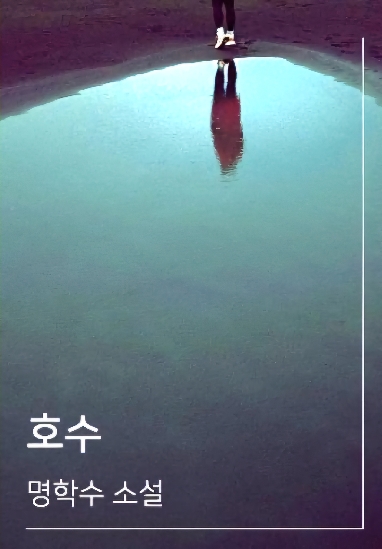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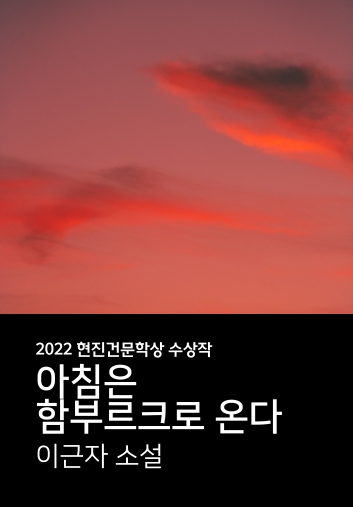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