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리뷰를 쓰기 전에
협주곡 (콘체르토) : 음악에서 2개(혹은 그 이상)의 음향체 간의 대립,경합을 특징으로 한 악곡. '서로 겨루다'는 뜻. 오케스트라 연주와 독주악기 기교 연주의 조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좀 뜬금없지만, 이 소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협주곡이 갖는 정의가 다소 도움이 되었어요. 협주곡은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독주 가능한 악기가 1대 혹은 그 이상(베토벤 3중 협주곡 장조는 피아노,바이올린,첼로로 3대의 악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어떤 악기가 솔로가 되는지에 따라 곡을 전달하는 느낌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
참신한 전개방식
<초대>의 서사는 정말 단순합니다. 제목처럼 초대의 서사가 전부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소설에서 어떤 서사를 기대 했다가는 다소 의아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저는 이 소설이 꽤나 참신 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글의 전개방식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소설에는 세 명의 인물, 인환, 아영, 정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셋 다 주인공이거나 셋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엥???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소설의 전개 방식이 참신하게 여겨진 까닭은 세 명의 인물이 모두 초점 화자 이지만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환의 초점으로 시작된 소설은, 아영에게로 바톤이 넘겨지고, 또 다시 정안에게로 넘겨집니다.
그렇다고 전체 서사가 개별 인물의 서사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서사는 현재진행형으로 쭉~ 흘러갑니다. 말하자면 협주곡처럼 배경으로 깔리는 오케스트라 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솔로가 되는 악기들이 바톤을 이어 받으며 각자의 파트를 연주하는 것처럼, 이 소설의 전개방식 또한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각자 다른 입장에서 서사를 진행하다보니, 더 이상 누구의 입장이랄 것도 없어 보이네요. 아영의 변덕에 질려 '지겨워'를 입에 달고 사는 인환의 입장도, 맨날 '미안해'를 남발하는 인환이 못마땅한 아영의 입장도, 또 그들 사이에 낀 정안의 입장도 이해되네요. 그럼으로써 이 소설에서는 일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감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듯 해요.
무엇보다 각 인물들의 심리묘사가 깔끔해서 좋았는데요. 작가님께서 일상을 바라보려는 시도가 꽤 섬세하면서 객관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그 지점이 다소 계산된 설정에 의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마치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할당된 연주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 소설이 초점 화자가 3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치밀하게 계산된(좋은 의미) 설정이 없었더라면, 전체 서사가 균형감을 놓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도 했습니다.
***
반전 결말이 주는 묘미
인환, 아영, 정안의 시점으로 전개되던 소설은 결말에 이르러 또 한번 초점화자가 바뀌게 됩니다. 인환, 아영, 정안 모두 결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초점화자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서사가 낭떠러지에 훅 떨어진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그냥 제 느낌을 말하자면. 이 소설이 전체적으로 협주곡처럼 쭉~ 흘러온 정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런 결말이 보다 자연스러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일, 이 글이 서사 중심으로 전개되는 글이라면 인환, 아영, 정안 셋이 초점 화자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셋 중 누군가 결말 부분의 초점화자가 되어 자신의 입장으로 글이 마무리된다면, 글의 전체 밸런스가 와장창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은, 이 글은 '서사' 중심이 아니라 '시점'중심으로 전개되는 글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다면, 결말 부분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제 4의 인물 또한 중요한 시점 화자로서의 지위를 맡게 될 것 같네요. 물론 분량은 아주 짧지만 말이죠. 협주곡에서 베이스에 깔려있던 피아노나 드럼 같은 악기들이 솔로 악기들이 사라지고 나서, 곡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듯. 제 4의 인물의 포지션에서 바라본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서사적인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이제껏 진행되어온 글의 모든 시선들이 한꺼번에 꽝~~~ 정리 되며 또 다른 반전의 여운을 남기는 듯 합니다.
글은 세 인물의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 진행되는 듯 하지만, 결말에 이르러서는 독자의 시선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립니다. '또 다른 시선'의 핵심키를 마지막 화자가 쥐고 있는 셈이죠. 그런 관점으로 소설을 읽으니, 서로 다른 시선들의 '겨루기'와 '조화'가 한층 긴장감있게 다가옵니다.
***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
모네의 유명한 말인데요. 소설에서 있어서 객관화, 거리두기, 낯설기, 여운 같은 것들에 관해 여러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일상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상을 공유하는 요소들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런 듯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균형감 있게 잘 구성된 이 글을 읽으며 일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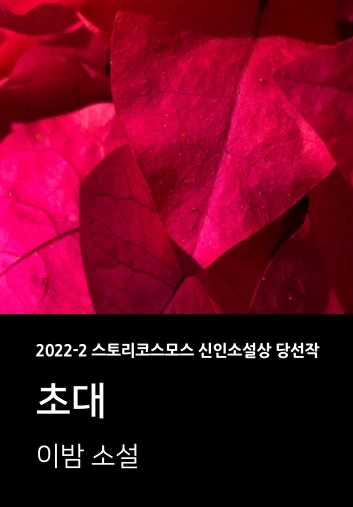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