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시인은 자신만의 언어적 세계관을 시로 담아내는 요리사일까.
<일인칭 식탁>을 읽고 나자 꽤 독특하면서도 프라이빗한 식탁에 초대받은 느낌이 들었다. 간단하게 그 느낌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한다.
- 첫 번째 시는 '젖은 것들은 욕망과 내밀하고'라는 부제가 붙은 [혀] 이다.
밖으로 넘쳐 물컹거리는 문장이다
먼 길 돌아온 너의 끝이 둥글다 (-혀, 발췌)
사실 첫 번째 시의 첫 번째 문장부터 쉬이 목넘김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이 낯선 언어적 조합은 대체 무엇일까? 라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 두 번 째 시, [나란한 밤]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이 솟구치는 컵에서 (...)
하루를 접어 더 이상 접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란한 밤, 발췌)
이처럼 시인은 일상에 존재하는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일상성으로 고착된 언어를 다른 관점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서 일상의 의미가 사뭇 낯설게 재조합 되어지는 것 같다. 마치 새로운 형태의 퍼즐처럼, 각각의 시를 제시되어진 언어적 조합대로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의미들이 맞춰지는 듯 했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전혀 바라볼 수 없던 새로운 세상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랄까.
- 그 중 [일인칭 식탁] 이라는 시에는 다소 비장한(?) 재치까지 더해졌다.
'단단한 접시가 쌓여간다'는 문장을 바닥에 던진다
이마에 담긴 뜨거운 수프가 깨져 버렸다 (-일인칭 식탁, 발췌)
일인칭 식탁의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으레 일상적인 식탁을 떠올리자면, 식탁 위에 어떤 요리를 한 상 가득 차려낼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일인칭 식탁은 다르다. 단단하게 고착된 것들, 쌓여가는 것들은 일단 바닥에 던지고 본다. 그러고 나면 이마 속의 뜨거운 수프가 깨져 버린다. 그 때 부터 일인칭 식탁에서의 상차림은 비로소 시작되어진다. '이마에 담긴 뜨거운 수프' 라니. ㅎㅎ 치열한 의미에 더해진 재밌는 표현처럼 와 닿아, 시인의 언어적 감각에 감탄을 하게 되었다.
이외에, 시집에 수록된 시들이 전반적으로 딱 필요한 언어로, 세련되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시적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는 듯 했다.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관찰력이 신선하게 와 닿았다. 무엇보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락을 쉽게 넘길 수 없었기에, 더 좋았던 것 같다. 급히 넘기지 않고 천천히 곱씹으며 각각의 시를 내 내면에 담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마지막 시, [태풍예보]의 한 구절로 리뷰를 마무리해 본다.
한 남자의 방향이 바뀌었다 (...)
우린 다시 태어나기 위해 무서운 풍속으로 날아가는 중이다 (태풍예보, 발췌)
단단한 일상성이라는 단어를 바닥에 던져 본다. 일인칭 식탁에 앉으면 내 이마에 담긴 뜨거운 수프도 깨져 버릴 수 있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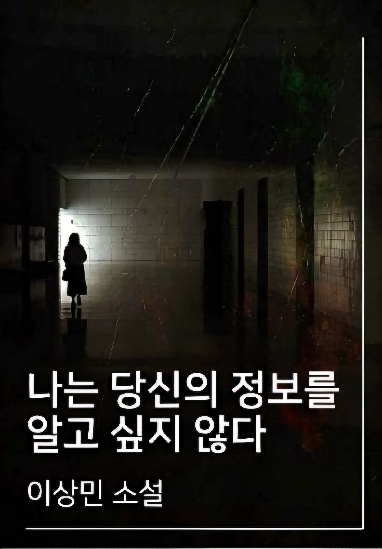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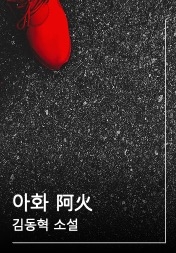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