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이 소설은 읽는 내내 감탄을 연발하다 금세 달고 깊은 잠에 빠지는, 그런 소설이 아니다.
감탄보다는 감정이 서서히 고조되어 책을 덮고도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소설이다.
깜박 졸다 눈가에 물기가 만져진다면,
“나 이전에도 여기 있었고” 나 이후에도 있을 몽구스가 사라진 뒤 소리 죽여 흐느낀 주인공처럼,
꿈에서 그렇게 흐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내버려두면 혼자 죽기 딱 좋은 황량한 땅으로 전출된 “나”는
목소리로부터 타조를 사육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리고 어느 날 피떡이 된 기오가 자루에 넣어져 내 앞에 던져진다.
그는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대를 받아 왔다.
고향에서 타조와 어울려 살았던 기오는 타조를 유인하고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다.
비결을 묻는 내게 그는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면 된다고 한다.
목소리는 내게 타조에 대해 말해보라고 한다.
아직도 타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지 묻는다.
그러곤 복종을 모르는 타조를 어떻게 때려죽였는지 내게 들려준다.
타조의 운명을 걱정하는 내게 기오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나 걱정하라고 냉소적으로 말한다.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타조들은 기오를 믿고 울타리를 순순히 나오고,
결국 군인들에게 끌려간다.
주영하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타조 이야기를 꿈꾸었고 깨어났을 때 흐느꼈다고 한다.
복종하지 않는 타조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범벅이 되도록 때려죽이는 장면에서
독자인 나도 흐느꼈다. 작가의 마음이 내게도 전해졌음이 틀림없다.
타조는 우리와 상관없는 먼 존재가 아니다.
소설에서, 타조는 주인공이고 기오이고 아버지인 동시에
아무 것도 모르고 전쟁에서 설쳐댄 “철딱서니” 군인들이다.
언젠가 “목소리”도 타조가 될지 모를 일이다.
현실에서, 타조는 나이고 너이고 우리 모두이다.
히틀러와 푸틴이 일으킨 전쟁과 그들의 군인과 무고한 시민과 난민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지뢰밭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지뢰밭 너머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라면
그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주저 없이 지뢰밭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이미 지뢰밭을 뛰다 피투성이가 되어있을지 모른다.
“목소리”는 권력을 가진 자의 다양한 변주이다.
소설에서처럼 전시 사령관일 수도 있고 국가 지도자, 회사 오너, 직장 상사, 부모, 교사,
그리고 급우를 ‘기생수’라고 놀리고 '빵 셔틀'을 시키는 부잣집 짝꿍일 수도 있다.
범세계적으로 나간다면, 기오를 학대하는 무리처럼 철저하게 우생학을 믿는 종족일 수도.
혹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너와 내가 “목소리”가 될지도 모른다.
양육강식 논리에 좌우되는 폭력적인 사회에서
“목소리”와 “타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어제의 목소리가 오늘의 타조가 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소설을 몇 개월 만에 다시 읽었는데도 거대한 울림통이 그대로였다.
“타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리뷰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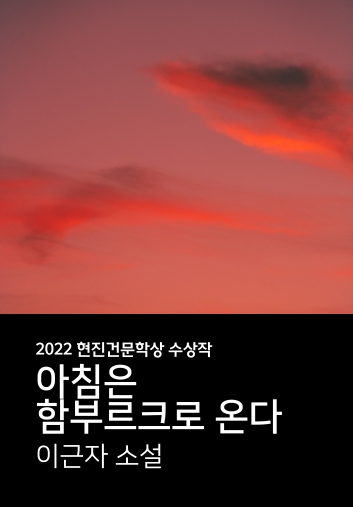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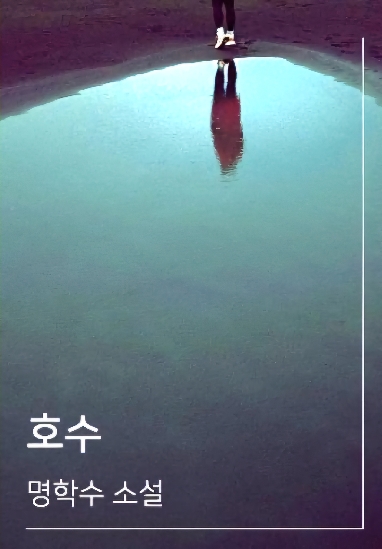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