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이 소설은 여성의 '거기'에 대하여 쓴 것이다.
방바닥에 거울을 놓고 흰 머리를 뽑다 문득, 정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거기'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거울을 내려놓고 일어나 조심스럽게 팬티를 벗었다. (본문 일부)
'거기'를 말하기 위해 소설의 도입부에 조지아 오키프의 검은 붓꽃 그림을 불러온다.
꽃잎의 속살은 은밀하게 감추어진 여자의 성기와 닮았다.
검은 붓꽃은 얼마 전에 본 나의 '거기'와 닮았다.
마음먹고 들여다본 나의 그곳은 신비롭기는커녕 생명력을 상실한 채 황량한 낯빛을 하고 있었다.
그곳, 성기, 음부, 버자이너. 버자이너의 원래 뜻은 칼을 넣어두던 칼집이라 했던가?
씁쓸한 기운이 입안에 감돌며 통조림 속의 과일처럼 밀폐된 내 처녀성을 생각한다. (본문 일부)
이와같은 연결고리로 미루어 <검은 붓꽃>의 소설적 도전은 파격적이다.
그것을 다루는 작가적 태도도 어물쩍거리거나 내숭를 떨지 않고 직설적이다.
<버자이너 모놀로그> 같은 책도 낡은 느낌을 주는 세상이라고 치면
소설에서 이 정도 용기를 내는 건 조금도 어색하거나 이상한 일일 수 없다.
커다란 중심사건 없이 엄마, 친구를 걸어 '거기'의 문제를 심화하고
자기 성찰적 결말에 도달하는 것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후감을 쉽게 정리하여 말하기 어려운 소설이지만
이것을 쓴 작가에게 격려와 힘을 주고싶은 소설이었다는 후감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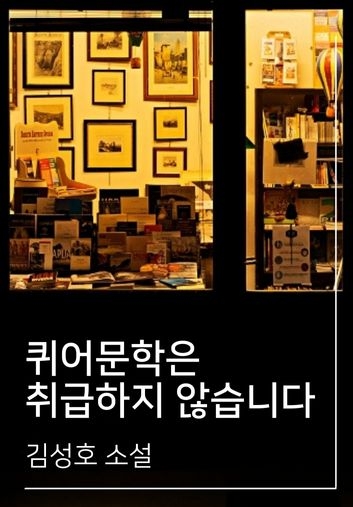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