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문학은 너무도 많이 죽어버려서 이제는 문학이 살아나면 아쉬울 지경이다.
문학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어 있었다. 아니,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어 있었다. 문학의 죽음은 <신사 트리스트럼 섄디의 인생과 생각 이야기>가 출간된 18세기에 최초로 언급되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 죽는 이유와 지금 죽는 이유는 전혀 다르다.
‘문학이 죽었다’는 한마디로 일축하기에는, 우리는 그 사이에 너무도 많은 말을 생략해 왔다. 문학 종언 담론의 대명사가 된 가라타니 고진이 말하는 ‘죽음’과 한국문단에서 말해온 ‘죽음’은 전혀 다른 문제로 읽힌다. 문단 안에서도 비평가니, 소설가니, 저마다 다른 식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
잠시 다른 얘기지만, 나는 작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해본 적이 있는데, 그중에는 허구한 날 ‘이 커뮤니티는 망했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유저들이 있었다. 화무십일홍, 달도 차면 기우나니, 무엇이든 흥하는 때가 있으면 가라앉는 때도 있는 법 아니겠는가. 그런데 유독 그 사실을 과장스럽게 떠벌리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시간에 글을 하나라도 더 쓰고, 이벤트라도 하나 더 여는 사람이 훨씬 도움이 되었다.
문학의 죽음 담론도 그런 거 아니겠는가. 문학의 죽음을 앞 다투어 다루려는 사람일 수록, ‘문학은 바로 나의 시대에 죽어버렸고, 나는 그것을 몹시 안타까워한다’는 식의 태만한 특권의식이 엿보인다. 이건 사사키 아타루가 조르주 아감벤을 비판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자신의 시대에 끝이 찾아오리라는 종말론적 사고관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전두엽 브레이커>에서 말하는 순문학과 장르문학의 퓨전, 아마도 그것이 현 시대 문인들의 생존전략일 텐데, 생각보다 그것을 능숙하게 해내는 작가를 찾아내기가 힘들다. 그나마 파우스트 계열의 세이료인 류스이, 니시오 이신, 마이조 오타로 등을 언급해볼 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마이조 오타로의 <쓰쿠모주쿠>를 추천하고 싶다. 문체는 라이트노벨과 크게 다르지 않고, 소재 역시 이야미스(추리소설의 한 장르로, 내용이 끔찍하여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타입의 소설)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사라져버린 비트(beat가 아닌 bit입니다.) 시대의 현실을 첨예하게 폭로했다.
이제 <전두엽 브레이커>에게 묻는다. 잘 퓨전했는가? 사실 장르문학을 “돈은 잘 벌리지만 실상 유치하고 수준 낮은 작품들”로 묘사하는 시점에서, 원만한 퓨전은 힘들어 보인다. 이 소설 전체가 “순문학을 하는 내가 장르문학의 수준에 맞추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더 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소설은 순문학적인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인간 내면에 대한 치열한 고찰이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나, 글쓰기 형식에 대한 문학적인 접근을 이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존나 쎈데 너희가 어디서 깝침?>과 <내가 글을 쓰는데 힘의 63%를 숨김>의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걸까.
결과적으로 보아, <전두엽 브레이커>는 장르문학의 수준을 의도적으로 더 낮추어 가상의 적을 만들어낸 느낌이다. 쉐도우 복싱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게 따지면 순문학에도 그 정도로 못 쓴 작품들은 널려 있을 텐데. 장르문학의 각종 클리셰들에 대한 비판이라면, 이미 장르문학에서 너무도 충실하게 해온 작업들이다. 이걸 굳이 순문학에서 다루어 내며, 특히 순문학 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소득 차이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럴 의도는 없었겠지만, 잘 나가는 웹소설 작가들에 대한 질투와 돈이 안 되는 순문학에 대한 비관으로 느껴진다.
너무 비판만 한 것 같아서 첨언한다. 사실 난 이런 류의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야,,, 재밌으니까. 문학에 대한 이야기, 문단에 대한 이야기, 문인에 대한 이야기.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메타적인 이야기들을 지나칠 수 없다. 작가가 쓰면서 즐거웠고, 독자가 읽으면서 즐거웠으면 그걸로 ok 아니겠는가?
뭐, 이정도로 해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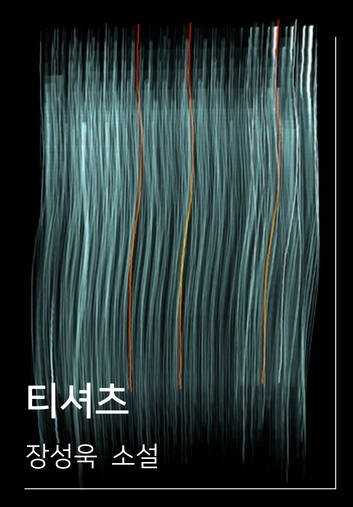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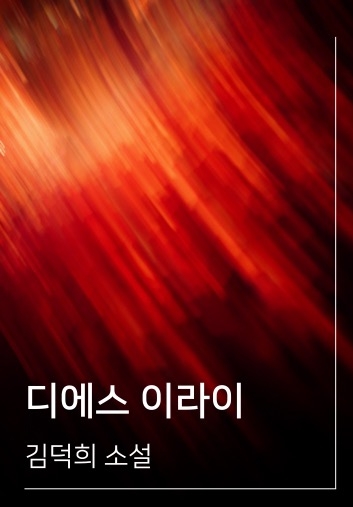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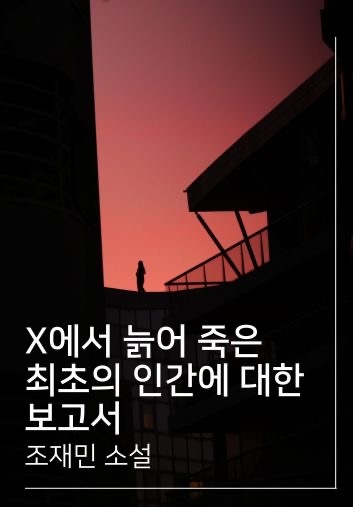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