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몸을 관통한 창(槍)에 대해 모르는 척하는 것이 이 지역의 룰이었다.
(-창, 박은비 본문 인용)
첫 문장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나도 모르게 그 지역의 주민이 된 것이다. 어느새 내 몸에는 어제와 오늘을 지나온 창들이 꽂혀 있었고, 나를 스쳐 지나는 사람들의 몸에도 어제와 오늘의 창들이 꽂혀 있었다. 룰은, 서로의 몸을 관통한 창에 대해 서로 모르는 척하기!
과연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힘이 느껴지는 첫 문장이었다. 잔뜩 부풀려지거나, 한껏 포장된 것이 아닌, 팽팽한 긴장감이 한풀 꺾이고 난 이후에 비로소 채워지는 내공의 힘이랄까. 거기에 시치미를 뚝 떼는 천연덕스러움까지 겸했다. 그래서일까. 꼼짝없이 목덜미가 잡힌 채 ‘이 지역’의 주민이 되어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사실 이 소설은 매우 쉽게 읽힌다. 스토리 라인이 거창하다거나, 캐릭터 자체가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다. 오히려 어디서나 볼 법한, 아주 흔한 인물의 이야기가 ‘이 지역 사람들의 몸에는 창이 꽂혀 있다’는 단순한 설정에 의해 전개되어지는 것이다. 탄탄한 스토리 라인 때문일까, 읽는 내내 많은 공감이 갔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소설에는 ‘직관적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조제된 약간의 마법 가루가 뿌려진 듯하다. 신기하게도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때면, 어느 샌가 내 몸에, 네 몸에, 그리고 우리 몸에 꽂힌 창들을 보게 된다! 소설 속에서 작가가 동원하는 직관적 상상력은, 이 소설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에게나 분명 현실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 스스로 눈덩이처럼 불려가던 고통과 상처가 어느새 형체를 잃어가며, 더 이상 그것들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상상력’이란 결국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의 한 방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특하고 재미있는 발상, 그 이면에 숨겨진 따스한 시선이 느껴지는 소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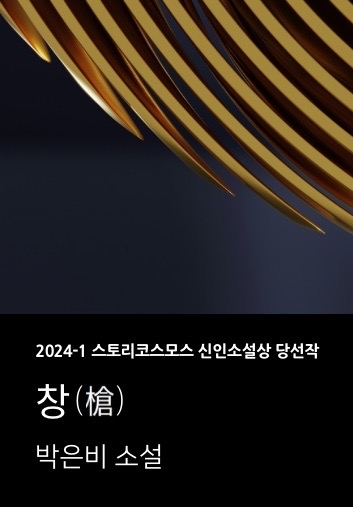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