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사랑의 시작보다 어려운 건 이별이 아닐까. 누군가와의 연을 끊어 내는 일의 힘듦은
함께했던 시간의 길이와 켜켜이 쌓인 감정의 두께에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박유경의 여분의 사랑은 사랑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별에 관해 말하고 있다.
주인공 다희처럼 사랑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
그와 나와의 공통점을 찾게 되고, 그가 하는 말을 일기장을 잠가둔 비밀번호처럼
가슴에 새겨두고, 그와의 거리를 점점 좁혀 가는 것, 그렇게 우린는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이별을 말하며 시작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그 힘듦에 대해서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건 사랑했던 그 때의 자신을 사랑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이별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갔던 레스토랑과 음식을 먹으며 나눴던 대화들, 상대방이 보여줬던 다정한 표정을
보며 행복해했던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일이다.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했을 때 행복해 했던 나의 모습과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한없이 다정했던 사람은 사라지고 어느새 폭력적으로 변해버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희처럼 헤어짐을 결심하지만, 헤어지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과거 그 사람이 다정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그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지만 다정했던 모습도 폭력적인 모습도 다 그 사람의 모습이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 보며 사랑을 이어나가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
소설은 미련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집주인과 그 집의 모습을 보여준다.
집에 갇힌 개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 그리고 베이고 상처투성이인 집주인의 팔, 이 것들을 통해
어렴풋이 미래에 대해 말하고 싶은지 모른다.
헤어짐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소설을 읽어보길 권한다. 소설을 읽고 나면
지금 연인에게 남아있을 여분의 사랑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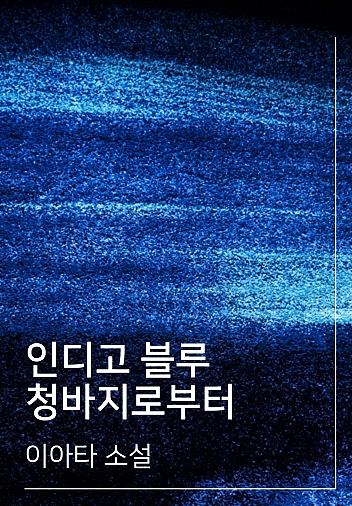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