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성질머리가 더러운 나는 '인간답지 않은' 것들을 보면 분노를 느낀다.
비겁하기까지 한 나는 '인간답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도 분노를 삭인다.
내 마음 속에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
'인간답지 않은' 것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마구 심판해버리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그 분노와 심판이 내 몫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비운다.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수 밖에 없는 딜레마.
사회가 존재하고 법이 존재하고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한 딜레마는 계속될 것이다.
<디에스 이라이>를 읽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경험을 한다.
마음 속 어딘가는 찝찝함이 남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소설'이기 때문에 찝찝한 마음을 침착하게 갈무리할 수 있다.
고귀하신 법의 심판이 차마 닿지 않는 곳에 정당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만약에'가 이야기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가 바로 <디에스 이라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어딘가 찝찝함이 남는 건 사실이다.
이 찝찝함은 만화(애니메이션) <데스노트>를 보고 나서 느끼는 것과 결이 비슷하다.
내가 <데스노트>를 좋아했던 이유도 <디에스 이라이>를 읽고 느낀 후련함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데,
두 작품 모두 한 가지 찝찝한 의문을 남긴다.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심판자들은 따로 있는데(법조인, 혹은 신의 영역)
그 심판자들을 제외한 이들에게 심판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옳은가?(정의로운가?)
만약 그 임의의 심판자가 '나'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나는 '정당하다'고 느낄 것인가?
이런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변화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어떤 깨달음 비슷한 것을 느꼈다.
분노의 감정은 솔직하게 느끼지만, 심판이 나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인공도 초반에는 비슷하게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결말에 다다랐을 때의 변화를 보고 '딜레마'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단, 마음 속에 간직한 '분노'에 회의적이지 않는 주인공의 태도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었다.
'인간답지 않은 것'을 보고 느끼는 '분노'의 감정은 솔직한 것인데, 이것에 무뎌지고 감정과 자아가 분리되다 보면 세상이 '싸늘한 무법지대'가 되어버릴 것만 같다.
나는 그런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의 변화가 시사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느꼈다.
<디에스 이라이>라는 작품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그런 지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에 추천하고 읽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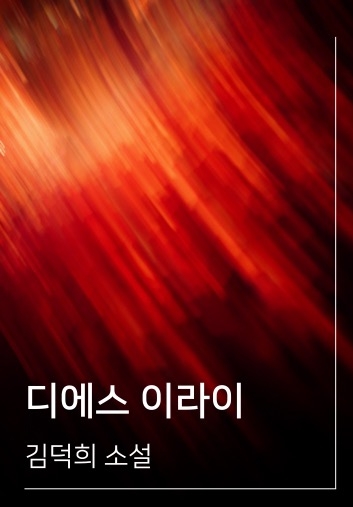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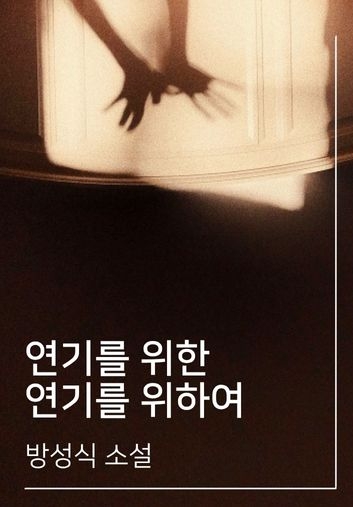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