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티셔츠> 속 티셔츠가 새하얗고 베이직한 것처럼, 소설의 구성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이 소설은 ‘나’와 언니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티셔츠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덧댄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티셔츠의 특성과 연관지어 소설을 해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티셔츠에는 단추도, 지퍼도, 주머니도 없다. 그저 구멍이 4개 뚫려 있는 흰 옷감일 뿐이다. 소설은 시종일관 그런 베이직한 스탠스를 유지한다. 눈을 떠 보니 언니가 티셔츠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몇 가지 해프닝이 벌어진다.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스토리의 전부이다.
그런데 이 단순한 플롯 속에 은폐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 어째서 ‘나’는 방에 틀어박혔나, 그들의 부모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언니는 김 부장과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질문들은 가볍게 언급되기만 할 뿐, 결코 일의 전모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정확히는, 그 숨겨진 일들에 대해 깊게 파고들려 하지 않는다.
언니와 ‘나’는 같이 살고 있고, ‘나’는 언니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지만, ‘나’는 언니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티셔츠의 새하얀 색감은 그런 ‘나’의 무지를 상징하는 것만 같다.
언뜻 보기에 티셔츠는 팔, 다리가 잘려 어디에도 갈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선 ‘나’와 언니 둘 다 그런 티셔츠 같은 인간이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서로를 구원해 줄 수도 없다. 티셔츠 속 무한히 펼쳐진 새하얀 공간은 가까운 듯 멀어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듯 하다.
티셔츠의 이미지에서 출발해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 이야기가 원래의 이미지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절하는 절제미가 보이는 소설이었다. 만약 여기서 ‘나’와 언니에 대한 사족이 더 붙었다면, ‘티셔츠’라는 제목은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소설을 쓸 때, 컨셉을 잡고 중심성을 잃지 않도록 스토리를 일관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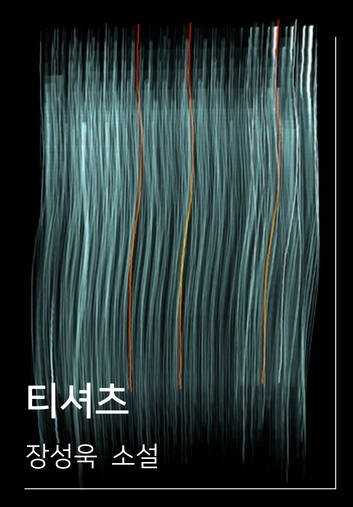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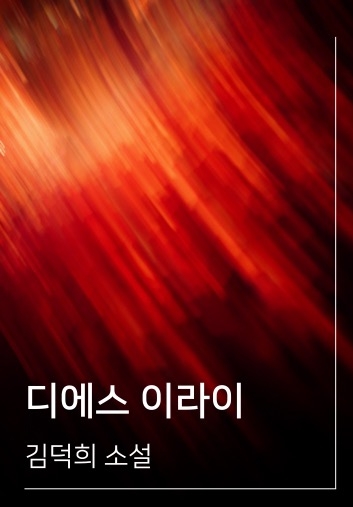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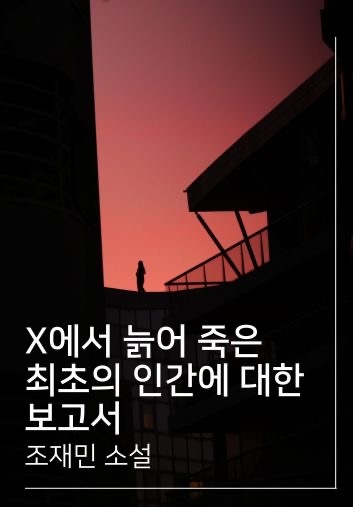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