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바야흐로 장르의 전성시대이다. 본격 소설을 위시하여, 판타지, SF뿐만 아니라, 보고서, 다큐멘터리 형식을 소설적 장르로 차용하기도 한다. 춘추전국시대처럼, 이러한 장르 팽창 현상은 왜 갈수록 진화를 거듭하는 것일까.
소설에서 이처럼 다양한 장르가 적극적으로 차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은 활자 예술로써 인간의 언어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그간 인간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언어는 더 이상 인간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총체적인 언어 모델의 관점에서 보자면, AI의 언어 모델 또한 그러한 총체성에 기여한다. 즉,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모델이 AI에게 적용되며,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언어 모델이 창출되며, 그것이 역으로 인간의 언어 모델에 적용되어진다. 흔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상의 모든 언어가 그러한 언어 모델의 범주에 속한다. 이로 인해 인간의 의식은 보다 세분화된 차원으로 확장된다. 정교한 언어와 의식에 갇힌, 진실에 이르는 길은 좀 더 다양한 차원의 낯선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현재 소설의 장르 팽창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어떤 진실에 이르기 위해, 작가는 모험을 감수하고 자기 앞에 놓인 수백수만 가지의 갈래길 앞에서 고군분투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소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객체가 되고, 그것이 전략적으로 택한 길은 하나의 형식이 된다.
정상에 이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저절로 열리는 ‘낯선 길’, 그렇게 ‘스스로 열린’ 길 앞에서, 작가는 낯선 두려움에 맞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현시대의 작가들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사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언어 하나만을 통해, 길이 끊어진 시공간에 지극히 사소한 푯대 하나를 꽂는 행위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재미와 의미라는 두 가지 소통의 키워드를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독자 또한 언어적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박은비 작가의 세 번째 신작을 읽었다. 이 소설은 남편이 키메라로 변신하는 내용이다. 리뷰에 앞서, 다소 장황하게 장르를 언급하는 이유는 작가가 차용하는 장르가 이러한 점에서 재미와 의미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은비 작가의 당선작인 <창>과 <아직 아닐 거라는 착각>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은 매우 쉽게 잘 읽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쉽다는 의미가 곧 쉽게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두 작품 모두 가족사를 다룬다. 대외적으로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은 시대이다. 그로 인한 사회적 소통의 부재와 단절은 각 개인의 몫이다. 두 작품 모두 가족사를 다루지만 그것은 가족 내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이 속한 공동체와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는다. 그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작가는 한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와의 소통의 부재를 장면으로 보여준다.
그 방식에 있어서 작가는 자신만의 장르를 펼쳐 보인다. 흔히 판타지 형식으로 불리지만, 박은비 작가의 작품은 현실에 보다 미세한 초점을 두고 있다. 대개 판타지가 보여주는 상상력이라는 것이 극대화된 망원경일 경우가 많다면, 작가가 보여주는 상상력은 보다 미세한 현미경에 가깝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인공의 내면에 쉽게 공감을 할 수 있으며, 낯선 이해의 지점에 서서 각자의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 작품 속에서 ‘낯설게 열린 길’로 저절로 동참하게 된다. 작품 속에서 남편이 키메라로 변신해야 하는 이유이다.
낯선 상상력과 더불어 쉽고 재밌게 잘 읽히는 소설. 독자를 복잡한 미궁에 빠트리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의미와 재미를 제공하는 소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보다 더한 소통의 미덕이 있을까. 머리 아픈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힐링할 시공간을 제공해주는, 작가의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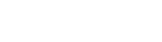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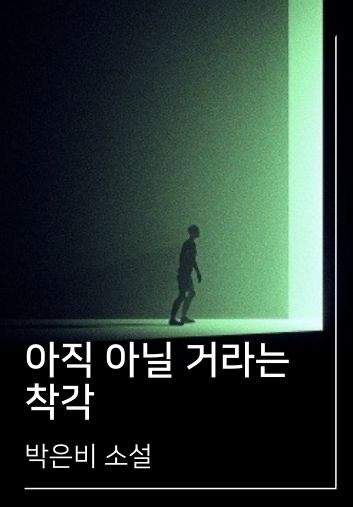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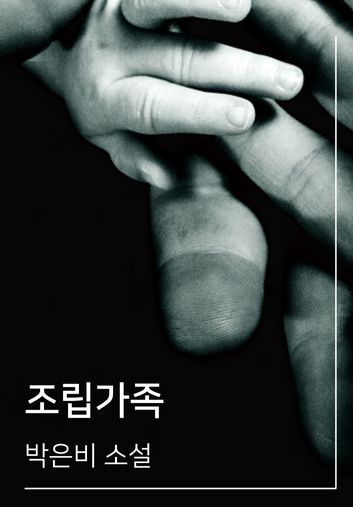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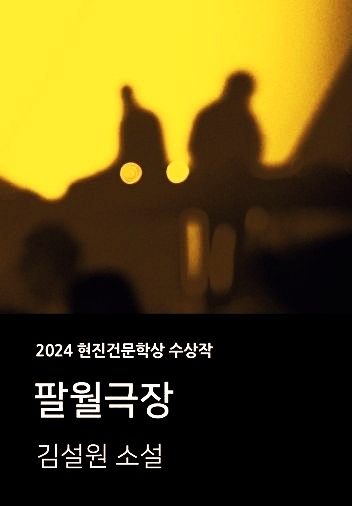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