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스포일러 주의: 소설 내용이 포함된 리뷰입니다.)
서울 인구가 포화 상태라는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험생들과 부모들의 입시 스트레스를 부추기는 교육 정책 혼선 또한 자주 듣는 소식입니다. ‘인 서울’ 러시만이라도 중단되어야 인구 밀집도가 조금은 낮아질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왠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읽다 문득 궁금해져서 통계청 지표누리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시’와 낮은 ‘도’의 차이가 극단적입니다. 서울 15,533명/㎢, 부산 4,258명/㎢인 반면에 강원 91명/㎢, 경북 137명/㎢입니다.(2023년 기준, 출처 — https://bitl.to/3nJR) 참고로 서울 면적은 605㎢, 총 인구는 2022년 기준 941.1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었습니다.
수도 서울을 ‘터져 버리기 일보 직전’인 공간으로, 그곳에서 ‘인 서울’을 목표로 공부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터져 버린 아이들’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에 크게 공감합니다.
단지 ‘터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설은 수험생들의 육체를 풍선처럼 부풀려 말 그대로 ‘날려보내는’ 상상력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변주까지 더합니다. 주인공인 국어교사 임지환의 반 학생 ‘준영’이의 머리가 터질 듯 부풀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장면을 보여 준 것이죠.
‘역시, 학생을 아끼는 선생의 존재가 아이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구나.’ 하고 안심을 하였으나, 결국 준영 학생도 풍선이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서울의 인구 포화와 ‘인 서울’ 러시는 과연 스승의 은혜 정도로 막아지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준영 학생이 날아가는/사라지는 장면이 독자인 제게는 ‘각성 포인트’였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따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연구와 정책 입안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임을 자각했다랄까요. 그리고 국어교사 임지환도 곧 풍선이 되어 날아간다는 점에서, 이 사태의 피해자가 학생들뿐만은 아니라는 작가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작가가 제시한 해법은 ‘리셋’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실제로 지구 대격변의 조짐이 그려집니다. 독자로서, 그리고 서울시 거주민으로서 ‘리셋’이라는 해법이 썩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리셋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서사를 지지합니다.
서울에서 머리가 터져 버릴 듯 괴로워하던 이들이 부유하여 모이는 곳이 바로 ‘사평’입니다. 소설 속에서도 잠깐 언급되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래빗 홀’ 같은 환상의 시공간입니다. 또한 치유의 성소이기도 합니다.
‘사평’마저도 이제 포화 상태라는 ‘래빗’의 하소연. 이 부분이 소설 「사평」의 절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 서울’의 낙오자들을 달래려고 조성된 곳인데, 여기도 인구 밀집도가 만만찮은 겁니다. ‘인 서울’에 진학하는 학생들 수만큼, ‘인 사평’으로 낙오되는 아이들도 많다는 사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조만간 터져 버릴 게 명약관화하다는 전망. 그러니 유일한 방법은 리셋일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
미주(尾註)까지가 이 소설의 완전한 분량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끝난 뒤 마치 에필로그처럼 덧붙여진 주석의 내용이 서늘합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제목인 ‘사평(沙平)’이 한강의 옛말일 뿐 아니라, ‘서벌’과 ‘서라벌’처럼 서울을 이르는 또 다른 본딧말 중 하나라는 설명. 즉 ‘사평’도 실은 ‘서울’이었다는.
소설을 다 읽고 영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퓨리오사가 몇 날 며칠 사막을 질주하여 ‘녹색의 땅’에 도착했지만, 이름만 ‘녹색’일 뿐 그곳도 결국 모래의 일부였음을 알고 절규하는 장면 말입니다.
「사평」이 웹툰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 보았습니다. 시각화된 ‘사평’의 이미지와, 별안간 머리와 몸이 부푸는 학생들의 모습이 무척 강렬할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웹툰이 나온다면 꼭 챙겨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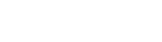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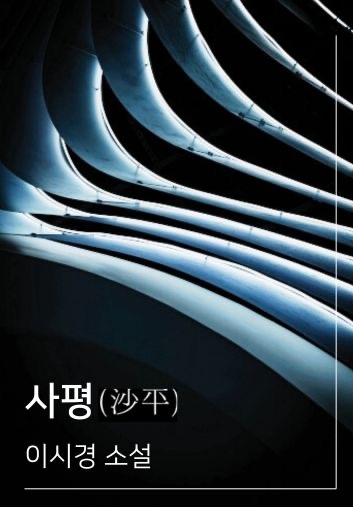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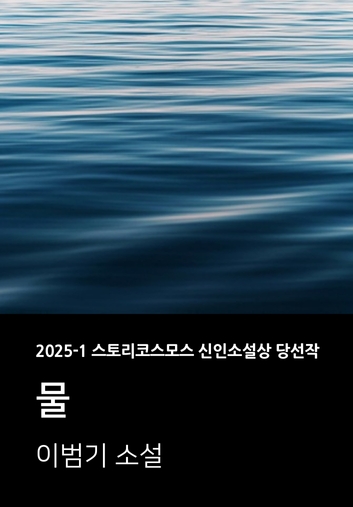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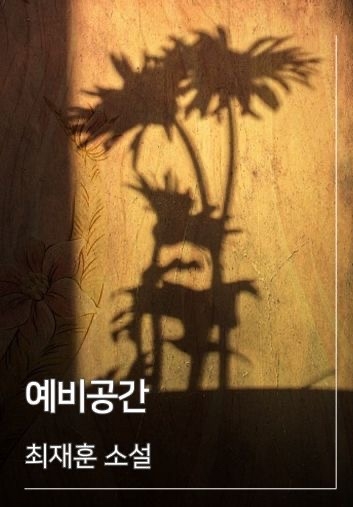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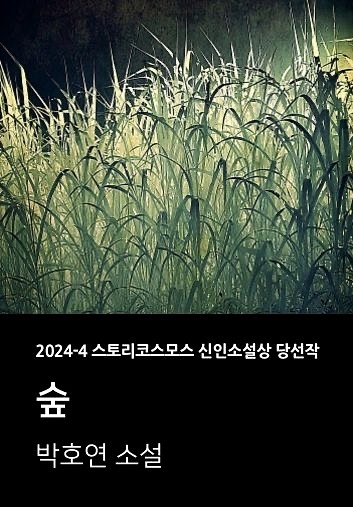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