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스포일러 주의: 소설 내용이 포함된 리뷰입니다.)
“살해 현장을 방불케 하는 처참한 광경과 냄새”라는 소설 초반부의 직접적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의 결말, 즉 ‘제물’의 실체를 예측해 보도록 만듭니다. 셀프 스포일러인 셈인데, 저는 이것이 작가의 의도라고 느꼈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취재 대상은 ‘제물’이 아니라 ‘동제(동신제사)’라는 걸.]
작가가 이런 안내판을 세워 둔 것 같았습니다. 안내에 따라 읽어 나갔습니다.
「동제」의 줄거리를 아주 간략히 요약하면 ‘군내(郡內) 소규모 월간지 기자의 취재 후기’입니다. 주인공이 현장 취재를 나서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사 작성의 기본 요소는 육하원칙이지요. 그래서 주인공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동제 준비에 한창인 마을 노인들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답을 못 듣는다는 거죠.
—
#1
“우리는 제사 때 정종 안 쓰고 감주 쓴다 아입니꺼.”
나는 그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막연한 대답만 돌아왔다.
#2
“신위를 묻는 과정이라예. 원래 동제 끝나고 쓴 신위들은 제물의 일부랑 같이 서낭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서 묻습니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옛날부터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그라지예.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네예.”
#3
동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건 과연 좋은 것일까. 미지근하게 식은 감주를 마저 들이켰다.
—
#1과 #2는 취재원들과의 문답, #3은 주인공의 자문입니다. 제주(祭酒)로 왜 감주를 써야 하는지, 제를 마친 후 신위(神位)를 왜 성황나무 앞 구덩이에 매장하는지, 동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누구도 답을 못합니다. 제주(祭主) 역할인 ‘주 씨’ 노인조차 이유를 모르고요. 하기야, 동제의 대상인 신주(神主)부터가 이미 미지의 존재입니다.
이쯤 되면 이 취재는 망한 겁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3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는지 아무도 이유를 모르고 단지 전통이라는 이유로 남아 있는 이 동신제사, 대체 뭐지⋯?
해체된 제물의 살점이 마치 소설 속 ‘껍데기만 남은’ 허례허식 동제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소설의 내용을 곰곰 곱씹을수록 소름이 돋는 것이, 동제 준비 과정 중 ‘이유가 명확한’ 것은 제물 해체가 유일했습니다.
과연 주인공은 추가 심층 취재를 이을 것인가. 진짜로 그 마을이 행해 온 동제란 일종의 ‘하드고어 고려장’이란 말인가. 독자는 알 수 없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중단했으니까요. 다만 소설에 기록된 전지적 기자 시점의 ‘팩트’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 볼 따름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무엇에게 죽음을 맞았는지도 불확실하고, 심지어는 시신도 없이 장을 치르는 마을. 거주민들의 관심사는 죽음의 대상이나 연유가 아니라, 그저 ‘제사’뿐인 것 같습니다. 제사-전통을 계속 잇기 위해 죽음을 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섬뜩한 감상도 해 보게 됩니다.
상여소리 인간문화재 추천을 받을 만큼 죽음을 큰소리로 만방에 알리던 ‘배 회장’. 그의 사라짐이 독자인 제게는 ‘죽음의 음소거’, ‘죽음의 익명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묘한 밸런스입니다. 제사를 전통으로 간직한 마을에, 정작 사람의 죽음은 소리도 이름도 없이 몰래 발생한다는 것이.
「동제」 후속편을 기대해 봅니다. 제대로 각성한 주인공이 목숨 걸고 ‘빡센’ 르포르타주를 쓰는 이야기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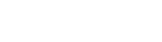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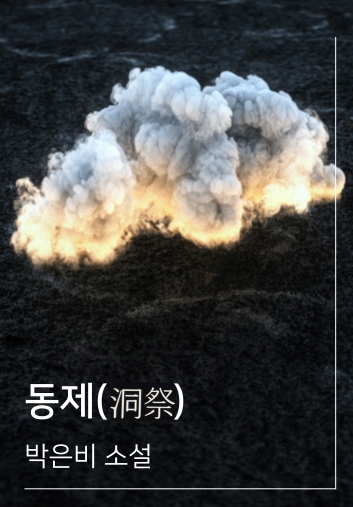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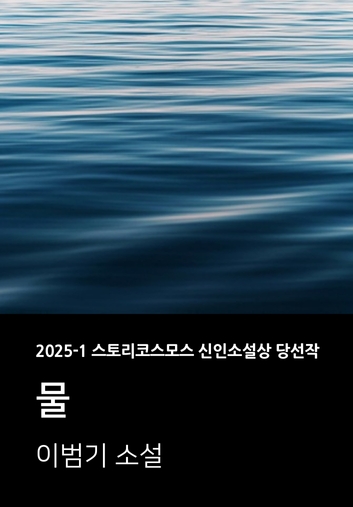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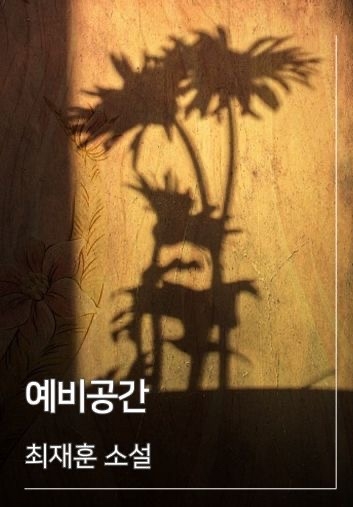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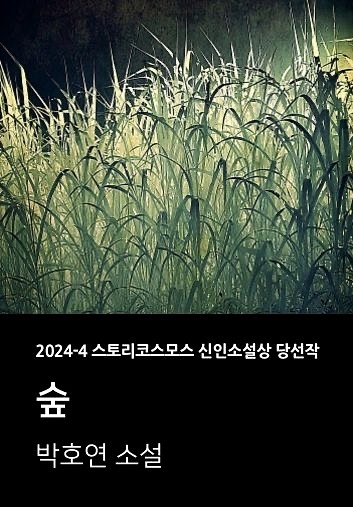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