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스포일러 주의] 소설 줄거리가 포함된 리뷰입니다.
독자인 제게 이 소설은 ‘창작자’의 ‘창작 기간’을 근사한 상징과 은유로 빚은 이야기로 읽혔습니다. 주인공을 이해해 보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다음의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① 숲속 목조 주택에서의 임시 거주, ② 글쓰기 모임 참여, ③ 난임. 셋 다 문자 그대로의 정보라기보다는 상징과 은유로 느껴졌습니다.
나무들이 빼곡한 숲에, 그 나무들을 재료로 만든 집에 혼자 머무는 주인공. 이제 막 창작을 시작해야 하는 이의 처지 같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라면, 이미 수두룩한 작품들로 둘러싸인 현시점에서 자기만의 ‘새로움’을 써 내야 합니다. 음악가도 비슷합니다. 수많은 기존 히트곡들을 레퍼런스로 참고하되, 표절 시비에 걸리지 않을 완연한 신곡을 뽑아 내야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글쓰기 소재가 왜 하필 ‘나무’인가. 그녀의 임시 거처가 ‘숲속 목조 주택’이기 때문일 거라 짐작합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이 만든 ‘나무의 집’에서 나무에 관한 글을 쓴다는 설정은, 창작자가 나무-레퍼런스 속에서 자기만의 나무-독창성을 짓는다는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공이 참여하는 글쓰기 모임에 “출간 작가”가 소속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혹은 되고 싶었으나 끝내 실패한) 롤모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인공이 자기다움-독창성을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내면의 불안과 의심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아닐까요. 일테면 이런 대목도 등장하지요. “출간 작가인 그녀”가 주인공의 나무 소설에 대해 평가하는 장면 말입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순한 맛이에요. 좀 더 선명하게, 펀치라인을 살려보세요. 등장인물들도 더 유용하게 활용하시고.”
이 단평을 주인공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소설 안에 굳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독자로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출간 작가한테 저런 소리를 듣던 시점에 주인공은 이미 창작자로서 자기 창작물과 ‘대화’하고 심지어 ‘사랑’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고,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든 크게 ‘마상’을 입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검토 의견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닐 테고, 취할 것을 취하되 창작자로서의 자존감을 쉽게 잃지 않는 건강한 패기를 갖추었다랄까요. 제가 읽은 「숲」의 주인공은 그런 창작자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난임은 「숲」 이야기가 ‘창작자의 창작 과정’으로 다가오게 된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흔히 창작의 고통은 산고에 비교되고는 합니다. 창작물을 ‘내 새끼’라 표현하는 창작자들도 더러 있고요. 오랜 난임 치료로 결국 ‘혼자’ 남게 되었다는 주인공의 사연은, 마치 지난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표작을 갖는 데 실패한 비운의 예술가를 연상시킵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 중에서도 친구 ‘미영’은 특별합니다. 어쩌면 ‘나무 씨’보다 더. 결혼 전에 덜컥 임신을 했고, 수염 기른 남편과 살며, 혼자 사는 친구를 각별히 챙기는 인물 배경 설명과 행동 양상이 제법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좀 과한 감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인공의 ‘베프’ 미영은 「숲」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문자 그대로’인 캐릭터로 보였습니다. 상징, 은유, 환상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기르고 남편과 살며 친구를 아끼는 존재, 그러니까 외로운 창작자에게 꼭 필요한 ‘실체적 위로와 격려’의 제공자랄까요. 아이를 가졌고, 남편과도 화목한 미영을 주인공이 부러워하거나 시샘하는 묘사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소설은 벌목의 계절이 도래하면서 절정으로 흐릅니다. 풍요로웠던 창작의 숲이 점점 허허벌판이 되어 갑니다. 그즈음 주인공의 나무 소설도 완성이 된 듯한데, 작품의 영감이 되어 준 ‘나무 씨’도 소멸합니다. 주인공 스스로 그것을 없앱니다. 땔감으로서 마지막 몫을 하는 ‘나무 씨’의 정념과도 같은 불길 속으로, 주인공은 자기 원고를 던져 태웁니다. 한 작품을 다 끝내고, 그다음 창작의 단계로 나아가는 결연한 의지처럼 읽혔습니다. 신성한 제의 같기도 했습니다.
창작의 숲에서 보낸 쓰고 잊고 다시 쓰는 계절. 「숲」이 선사하는 감동과 메시지가 소설 속 적송처럼 우람하기 그지없습니다. 주인공은 또 어디를 찾아 홀로 머물게 될까. 그곳에서 만나고 또 이별하게 될 ‘○○씨’는 어떤 모습일까. 베프 미영이는 주인공에게 무슨 반찬을 해 가지고 놀러올까. 다 읽고 나니 ‘나만의 ○○씨’보다는, 언제나 곁에 있어 줄 ‘미영이’가 더 절실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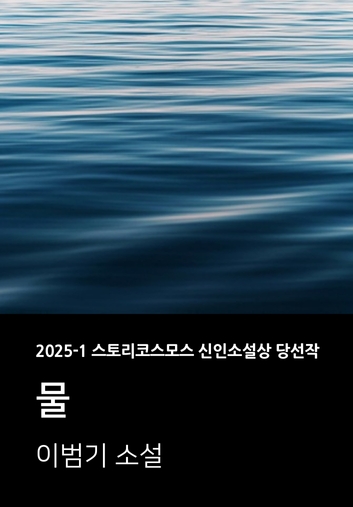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