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소설가는, 언어를 통해 영감의 바다로부터 전혀 새롭고 낯선 이야기를 건져 올린다. 낯설고 새롭다는 것의 의미는, 인류 공통의 의식을 기반으로 하되,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유일무이한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낚아 올릴 것인가. 이 문제는 작가만의 스타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박은비 작가의 조립 가족을 통해 낯설고 새로운 스타일에 대해 떠올려 보았다.
바야흐로 가족의 형태가 급변하는 시대이다.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과거 대가족이 주를 이루던 시대로부터 핵가족 시대에 이르러, 1인 가구의 형태까지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는 예상치 못한 존재가 우리의 일상까지 넘보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후 우리의 가족 형태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까.
위 질문과 관련하여, 다시 작가의 스타일로 돌아가 이 소설에서 가장 의미 있게 와 닿은 지점은 다음과 같다.
(박은비 작가 님의 소설은 매작품마다 독자에게 재미와 의미를 주며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에, 재미와 의미라는 두 마리 토끼는 덤으로 가져간다.)
ᅠ
그것은 바로 조립 가족이라는 말에서 그 해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누구도 사용한 적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단어이다.
신기하게도, 조립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마치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할 가족의 형태를 보는 것만 같았다.
어쩌면 반려로봇과 AI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의 의식은 조립 가족이 보여주는 일상에, 이미 진입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조립 가족에서 젊은 부부가 로봇 아이를 대하는 모습은 진짜 인간 아이를 다루는 것과 동일하다. 그들은 로봇 아이에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그만큼 '사랑'에 가까워지게 된다. 흥미로운 지점은, 로봇 아이를 흙에 묻는 장면이었다. 기술 진화의 정점에서 '흙'이 주는 의미란 무엇일까.
조립 가족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으로 조립된 가족이 아니다. 오히려 파편화된 사랑을 통해, 가족에 내재하는 사랑의 원형에 대해 말해준다. 누구나 자식을 키우면서 겪을 법한 대내적 상황이 자연스럽게 기술된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가족 사랑의 연대감을, 파편화된 조립 가족의 형태를 역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낚시를 안 해 봐서 잘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소설을 쓴다는 행위가 언어(言語)를 낚는 행위와 유사하다면, 이처럼 유일무이한 언어(言魚)인 '조립 가족'을 낚고 잘 가공하여 독자의 식탁에 올려준, 작가의 독창성에 감사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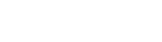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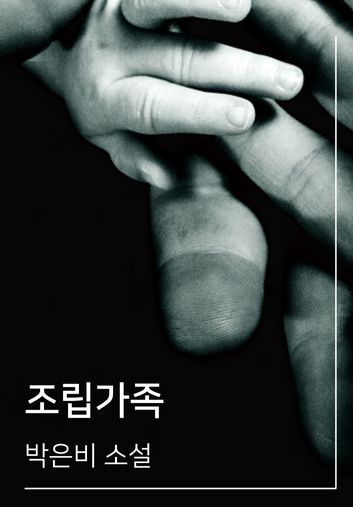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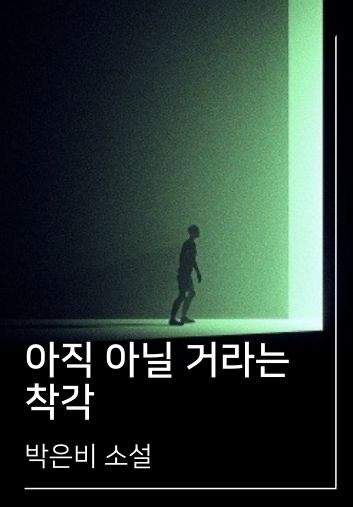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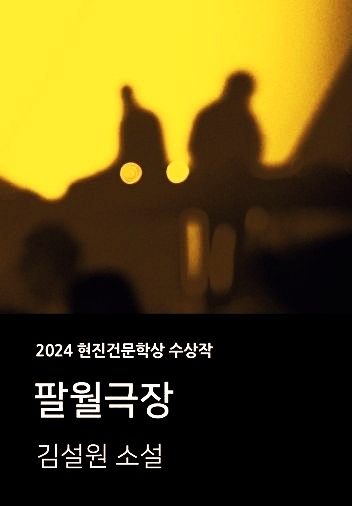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