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스포일러 주의] 소설 내용이 포함된 리뷰입니다.
소설 제목이 ‘바다’가 아니라 「물」인 이유를 곰곰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일본인 스쿠버 다이버 사카미즈가 자기 일터인 인도네시아의 바다에서 겪은 사연. 이것이 「물」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인’과 ‘인도네시아’의 등장이 자연스럽게 ‘쓰나미’(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라는 세 글자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야기의 생동감과 핍진성을 담보하는 요소입니다.
사카미즈의 사연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6층 높이의 해일이 연안을 덮쳐 인명 피해를 일으킨다, 바닷속에서 근무 중이던 다이버는 천재(天災)를 운 좋게 피하여 살아남는다, 이를 계기로 일을 그만두고 도시의 수영 센터 강사가 된다, 바다에서의 끔찍한 경험에 현재의 삶을 잡아먹히지 않도록(“살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이따금 마주해두는 편이 나아.”) 해변 풍경 포스터를 집에 걸어둔다, ⋯⋯.
바다에서 수영장으로, 물의 자연에서 물의 시설로 이직한 셈입니다. 규모와 안전성의 차이가 있기는 할 테지만 바다든 수영장이든 다 같은 ‘물’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물(水, 미즈)을 머금은 이 스쿠버 다이버는 어쨌거나 물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가 봅니다.
일본어 사전에 ‘사카미즈’를 검색하니 ‘열극수(裂隙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지하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물’을 뜻하는 지질학 용어라고 합니다. 이 낱말을 소설 「물」에 흘려 보낸다면, ‘내게 보이지 않고 내가 어찌할 수도 없는 어떤 거대한 삶의 흐름’ 정도로 여과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바다는 벗어났지만 또다시 물-수영장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사카미즈의 처지와 썩 잘 어울립니다. 소설 제목이 ‘바다’가 아니라 「물」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독자로서 제가 꼽은 「물」의 백미는 ‘백상아리 이빨’ 에피소드와, 대단원 부분에서 사카미즈가 ‘GH’라는 인물(아마도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을)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소설 속에서 몇 차례 언급된 것처럼 백상아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서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웬 수상한 노파는 백상아리들의 이갈이 후 해저에 침전된 이빨들을 찾아내라 닦아세웁니다. “비명횡사한 내 아들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는 걸로 보아 백상아리에게 자식을 잃은 모양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는’ 듯합니다. 그 바다엔 존재하지도 않는 어종을 ‘아들을 물어 죽인 것’으로 상정한 심리 상태. 이 노파에게 바다의 이미지란 백상아리 혹은 백상아리의 이빨로 남고 만 것이 아닐까요. 노파가 얘기한 사연의 진위 여부는 소설에서 그리 중대하게 다뤄지지 않는데, 저는 이 지점이 「물」의 소설적 아름다움이라고 느꼈습니다. 바다에 이빨이 있다, 바다는 사람을 물어 죽인다, 물이 나를 물었다, 라는 상상력의 확장을 구현하는 장치라서요. 사카미즈가 바다 밑바닥에서 건지려던 ‘이빨’이란 사실, 누구나의 삶을 멋대로 가학하고 사라지지만 아무런 흔적도 실체도 파악되지 않는 ‘불행’인 것입니다. 애초에 형체 없이 닥치는 불행이, 고작 얼마간의 물질로 발견될 리가 만무합니다.
「물」의 두 번째 백미는 그 위치 선정 또한 더없이 적절합니다. 하필 소설의 마지막에, 이야기의 끝자락에 스-윽 떠오르듯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설 속 장면을 빌리자면, 마치 파고가 지나간 뒤 해수면 위로 “얼굴을 물속에 박은” “몇 ‘구’”의 사람들이 너울대듯.
GH라는 인물 또한 ‘백상아리 노파’만큼이나 수상쩍습니다. 스스로 살인범임을 밝히는데, 이 역시 노파의 백상아리 목격설처럼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져 물을 성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카미즈가 그에게 겁을 먹었고, 그리고 그가 사카미즈가 소지하고 있던 백상아리 이빨(‘이것과 똑같은 걸 찾으면 돼’라는 일종의 견본으로 노파에게 받은)을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이빨은 사카미즈에게 ‘찾아야 할 것, 하지만 매번 찾는 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재확인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의 공식을 따르자면 바다-물, 백상아리, GH는 모두 ‘이빨을 가진 존재’이자, 사카미즈 입장에서는 찾아내고 규명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물고 마음속 잠연한 심해로 끌고 들어갈 괴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한테 대체 왜 이런 불행이 닥친 것인가⋯.’
이 짧은 탄식이 바다이자 물이고, 백상아리와 GH의 이빨이 아닐까, 하고 감상했습니다. 소설 마지막에 사카미즈가 남긴 다음의 말은 그래서, 바다 같고 물 같습니다. 잠잠한데, 그 밑으로 백상아리가 입을 벌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데 그 인간이 거기 어디서 물에 잠겼다면 말이야, 인도네시아 바닥 어딘가에는 정말로 백상아리 이빨이 있겠군그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의 어찌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생활인, 또는 생존자의 소설 속 최후 발언이 이토록 무섭고 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독자로서의 의견입니다만, 사카미즈의 저 말이 없었다면 「물」은 지금보다 얕았을 것 같습니다. 기시 유스케의 「아귀의 논」이나 「푸가」와 같은, ‘마지막 한 방’이 독자의 소설 읽기 감흥을 한껏 끌어올리는, 독자의 긴장을 끝내 풀어주지 않은 채로 (좋은 의미의) 찝찝함을 안기는 이야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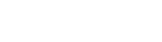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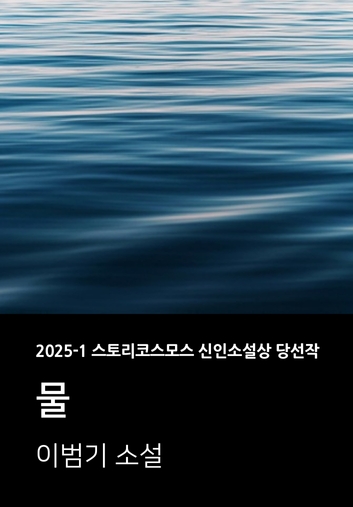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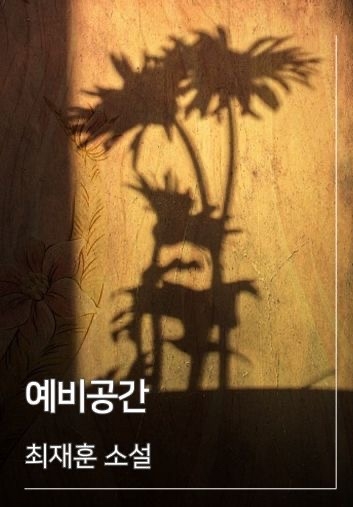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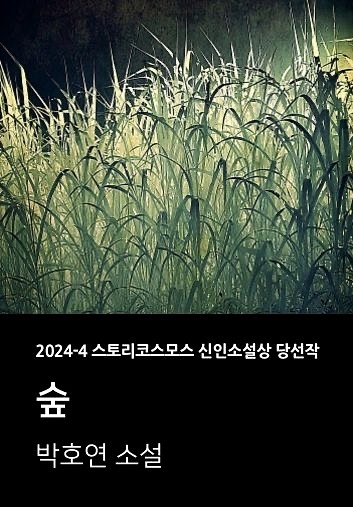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