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이 소설은 ‘살아 있으나 살아 있지 않은 존재들’의 이야기다.
도심의 병원, 영화관, 모텔, 낡은 주차장 등 일상적인 공간들이 등장하지만,
그곳에는 아무 생동감도 없다. 모든 것이 퇴색된 색감으로 묘사된다.
그 무표정한 세계 속에서 남녀는 서로의 고통을 거울처럼 비춘다.
그들의 대화는 감정의 교류라기보다 공허의 되비침처럼 읽힌다.
이 소설의 문체는 절제되어 있고, 감정의 폭발을 의도적으로 억누른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섬세한 울림이 있다.
독자가 인물들의 냉담한 행동을 따라가면서,
차츰 그 아래에 숨은 절망과 체념을 읽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 작품을 읽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된다.
“나는 지금 생물인가, 사물인가.”
감각이 닳아버린 시대에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 소설,
오랜만에 새롭고 낯선 감성, 그리고 완성도 높은 소설을 읽게 되어 기쁘다.
이 작가의 다음 소설이 기다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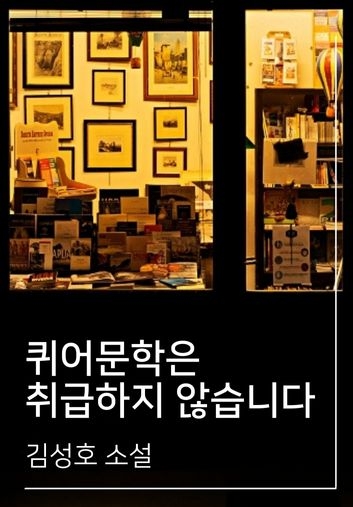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