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작품을 쓰기 위해 고립을 택한 작가가 작업 틈틈이 갈무리해둔 내밀한 기록.
누구도 아닌 작가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을까 짐작했지만 그래서 더 울림이 컸다.
에세이처럼 읽으면 20분에 끝나는 분량. 곱씹어 읽으면 다른 걸 보게 된다.
쓰는 사람은 자기 글의 행간에 붙박힌 존재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쓰기는 자신과 싸우는 일이기보다는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것.
어쩌다보니 집과 떨어진 곳에서 읽었다. 집에서는 잘 써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온 여행지에서였다. 늦가을 날씨는 눈부셨고 8천원 백반 하나에도 기막힌 반찬이 열 접시는 딸려 나오는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난 3일 내내 어떤 맛도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 자신이 왠지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저녁 무렵, 문 닫을 즈음의 불 꺼진 시장을 지나다가 청양고추 2천 원어치를 샀다. 숙소 공유 냉장고에 누군가 두고 간 쌈장이 있었는데 그 쌈장에 찍은 청양고추와 소주가 진짜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라는 걸 깨달았다. 실제로 그걸 먹는 내내 정말로 행복했다.
때때로 미식은 사라지고, 글 또는 글에 대한 생각들만 남는다. 이런 바보 시절이 영 바보 시절만은 아니라고 이 작품은 말해준다. 동시에 그런 시절은 가능한 짧아야 한다는 것도.
작품 안에는 사발면, 식사에 곁들인 소주 반병이 자주 등장한다. 반가웠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경춘식당도 인상 깊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건 글에만 소용하겠다고 생각했던 작가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닿았던 주변의 풍경들이다. 나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오랜만이야’ 인사를 건넬 수 없었던 20년 전의 군대 후임, 장날 나들이를 위해서라면 10미터 거리쯤이야 가뿐히 건너뛰는 할머니들의 아침 인사 같은 것들. 그런 장면들이 작품 곳곳에 햇살처럼 내려앉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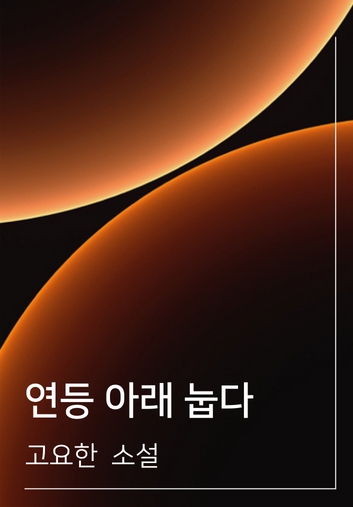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