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는 물과도 같아서 어디론가 계속 이주하기 때문이다. 작중 인물들도 그렇다. 어린 시절 소꿉친구를 우연히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을 그린 <센티멘털 요정>은 오래간만에 만난 두 사람이 과거를 추억하도록 두지 않는다. 오히려 각자의 삶에 던져넣기 바쁘다. 찰나의 재회는 요정의 장난처럼 느껴진다.
마립이 기억하는 어린 명훈은 항상 미소를 짓고 있다. 웃는 얼굴에 가까운 인상이었는지도 모르나 기억 속에 머무르는 명훈은 천진한 웃음을 유지하고 있다.
작품은 요정을 좋아하는 천진난만한 명훈의 얼굴 위로 ‘세타아악-’을 외치는, 바쁘고 피곤한 성인 남자의 얼굴을 겹쳐놓는다. 웃는 얼굴-피곤한 얼굴로 이어지며 한 사람의 인생‘상’을 그리는 것에 주목한다.
사람의 생애는 숨겨지지 않고 외연으로 드러난다. 마흔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있던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덕목을 은근히 부추기는 말일 수도 있으나, 그 안엔 삶의 회로가 얼굴상으로 나타난다는 암시가 들어있다.
마립이 명훈의 외연을 통해 경험하는 것은 그가 어릴 적 모습과 다르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나온 명훈의 삶을 들추지도 않는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생의 비애가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마립은 명훈과의 이별을 통해, 속력을 붙이며 다가오는 ‘세월’의 무상함을 체험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당시엔 헤어짐인 줄도 몰랐던, 만남과 헤어짐의 한때를, 앞으로 몇 번은 더 바뀔 상을 상상하며.
그 순간 마립은 자신의 얼굴상 역시 계속 바뀔 것이며, 기억과는 정반대로, 시간은 역주행이란 드라마 없이 유유히 흘러갈 것이란 걸 예감한다. 작품의 마지막엔 얼굴상을 낙엽화 한다. 그것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두 사람의 유년 시절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생의 상을 그리기 위해 감각기관에서 벗어난 변주를 그렸다고 볼 수도 있겠다.
나에게 이 작품은 작가와의 만남과 헤어짐을 동시에 겪게 했다. 그를 알지 못하지만 함께했다는 묘한 감각을 느낀다. 간혹 이 작품이 생각날 것 같다. 내게도 요정이 왔다 가면 그럴 것 같다. 작품을 읽고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거나, 자신의 얼굴이 궁금하다고 느껴진다면, 다소 센치해져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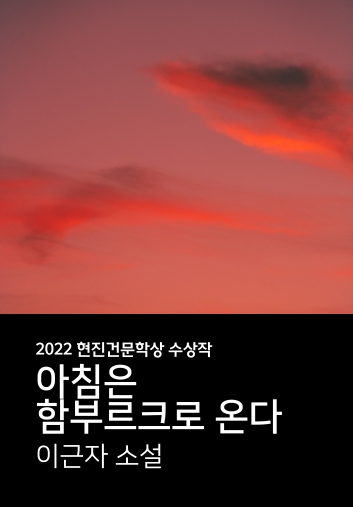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