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암스테르담 가라지세일 두 번째>가 김솔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이었다.
그 소설집을 읽었을 때 받았던 충격이 엄청났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로부터 아마도 한국소설계의 젊은 작가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잠시 잠깐, 그저 한 번 시도해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김솔 작가의 내적 심화는 한국소설계의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독보적 위치를 점해가고 있다.
이번에 스토리코스모스에 김솔 작가의 단편이 올라온 걸 보고 잽싸게 구매해 읽었다.
김솔 작가의 오대양 육대주, 시대와 경향을 무시하는 독자적 항해는 더욱 심화되어
이번에는 중세 수도원을 배경으로 미스터리한 기법의 소설을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배경에 비해 주제는 작가-독자-책의 관계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하게 만든다.
작가의 말에는 이런 진술이 있다.
(독자에게) 말하지 않는 책과,
(책에 대해) 말하지 않는 작가에 간섭받지 않을 때독자는 (책과 작가 따위에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독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쉽지 않은 문제이고 주제이다.
과연 독자가 작가와 책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고
책과 작가 따위에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독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든 책 문제의 귀결이 결국 독자에게 전가된다고 가정한다면
독자는 결국 자기 인생을 기술하는 작가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모든 책은 독자를 작가로 만들 수 있지만
현실의 독자는 아직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층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리뷰를 쓰는 것도 그런 걸 반영하는 것일 터!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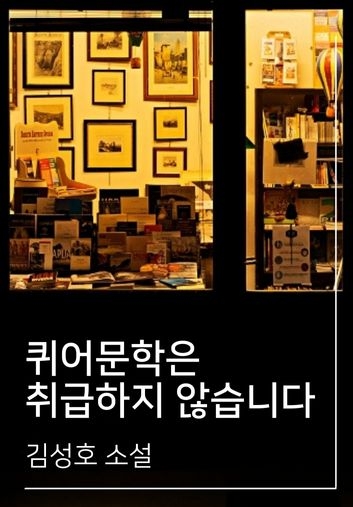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