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서른 즈음이던가. 한집 사는 남자의 손을 잡아도 아무 느낌이 없던 것이.
친구는 내게 미친 년, 했다. 한집 사는 남자에게서 뭘 바래.
그녀는 한집 사는 남자의 발이 잠결에 스치면 자신의 발을 이불 밖으로 뺀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탈리아로 떠났어야 했을까. 이 소설의 여자처럼.
반찬거리 사러 가는 행색으로 슬리퍼에 지갑과 여권만 들고.
아주 사소한 일로 더는 일상을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여자는 남편이 선물로 준 자줏빛 스카프가 그랬다. 자줏빛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렇게 떠날 이유가 될까.
하지만 무슨 일이든 표피를 걷어내면 얽히고설킨 무언가 있기 마련이다.
여자의 복잡한 심정은 베로나의 광장 나무의자에 조형물처럼 앉아 있는 남자를 통해 드러난다.
비행기에서 여자의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남자.
그는 아내를 기다린다. 하염없이.
여자는 남자에게 2년 7개월 전 이탈리아에 온 이유를 말한다.
버린 여자는 버려진 남자가 측은하다. 여자는 남자를 하룻밤 재워준다. 남자의 울음이 벽을 흔든다.
구효서 작가의 ‘밤이 지나다’를 이상문학상 작품집에서 읽은 적 있다. 인상 깊었다.
작가는 방황하는 여자들의 심리상태를 탁월하게 묘사한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일부를 만나곤 한다.
철갑나무가 뭘까 궁금했다. 도끼로도 쓰러뜨릴 수 없는 나무라고 한다.
부족의 여인들이 그 나무를 베어달라고 남편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된다는.
베로나의 광장 나무의자는 햇살과 바람 속에 요지부동인데 우리의 사랑은 늘 흔들린다.
친구는 또 미친 년, 할 것이다.
뭘 바래.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속설을 서른 즈음 알았더라면,
삶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그대여, 연인과 헤어지고 싶다면, 베로나의 광장 나무의자에서 만나자고 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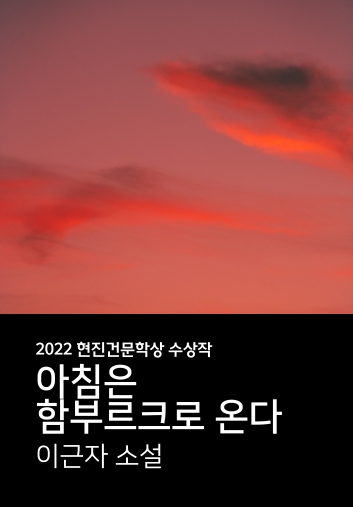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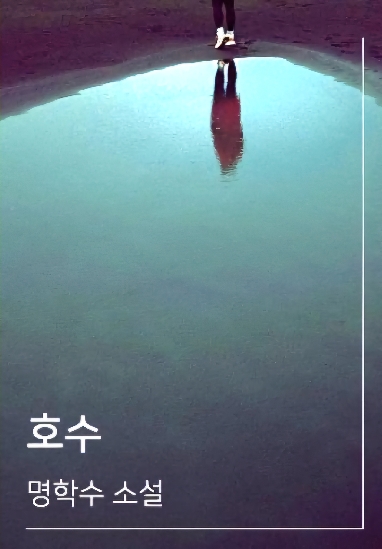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