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디에스 이라이 김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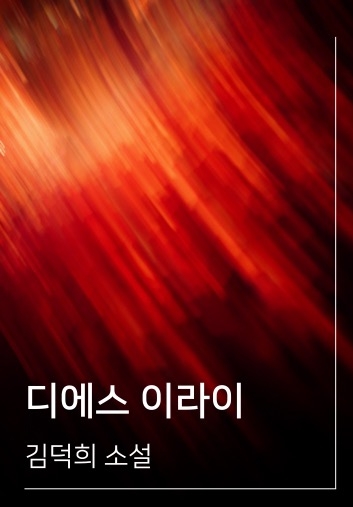
 HOME
HOME한 알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고 영양소도 필요한 만큼 들어 있는 알약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자취생 때부터 해왔다. 2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약은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500년 정도 먼 미래를 상상해봤다. 식자재가 낭비되는 일도 없고 굶주리는 사람도 없는 세상일 거라 기대했는데 뜻밖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식욕을 500년이나 엄격히 통제받아 이제는 맛의 개념조차 모른다. 그런 한편으로 일부 기득권층에서는 그동안에도 진짜 음식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왔다.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작품은 이 모순 덩어리의 사회를 뒤집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무기는 고문헌 한 권이 전부다. 그것은 500년 전 어느 주부가 사사로이 기록한 요리 노트다.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구해 사설 인가자로 부렸다. 키부스 생산 라인에서 신선한 식자재를 빼돌려 사설 인가자로 하여금 음식을 만들게 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긴 찌꺼기는 몰래 키부스 생산라인에 다시 투입되었다. 폭동이 일어나도 시원찮을 짓인데도 사람들은 ‘힘 있고 돈 있는 분’들의 소박한 유희 정도로 이해해줬다. 죽을 때까지 키부스만 먹어야 할 주제가 빤하지만 사람 팔자 모를 일이니 혹시나 그들처럼 호사를 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었다.
영욱은 생소한 이야기에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가능한 한 골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때 주희가 은박지로 감싼 지우개 크기의 물건을 건넸다.
“먹어봐.”
은박지를 벗기자 부드럽고 탄력 있는 하얀 덩어리가 나왔다.
“백설기라는 떡이야. 쌀가루라는 걸로 만든 음. 식.”
“음식, 이라고요?”
영욱은 갑자기 커진 자기 목소리에 지레 놀라 얼른 숨을 삼켰다. 그런 뒤 지금까지 스터디룸의 벽을 뚫고 들어온 잡음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주희가 영욱의 손에서 떡을 절반쯤 떼어 자기 입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살살 씹어서 먹는 거야. 이 안 나가게 조심해. 오백 년 전엔 음식을 늘 씹어먹어야 해서 이가 손가락을 잘라버릴 수 있을 만큼 튼튼했대. 대단하지 않니?”
영욱은 적어도 독이 든 건 아니라는 데 안심하며 ‘떡’을 입에 넣어봤다. 그 순간 혀에 감기는 감칠맛과 포슬포슬하면서도 쫄깃하며 부드러운 식감에 놀라 눈이 커졌다.
“어머, 표정이 변하네? 느껴지니? 그게 맛이란 거야. 그렇구나, 정말 너도 맛을 느낄 줄 아는구나.”
영욱은 주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영욱은 생소한 이야기에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가능한 한 골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때 주희가 은박지로 감싼 지우개 크기의 물건을 건넸다.
“먹어봐.”
은박지를 벗기자 부드럽고 탄력 있는 하얀 덩어리가 나왔다.
“백설기라는 떡이야. 쌀가루라는 걸로 만든 음. 식.”
“음식, 이라고요?”
영욱은 갑자기 커진 자기 목소리에 지레 놀라 얼른 숨을 삼켰다. 그런 뒤 지금까지 스터디룸의 벽을 뚫고 들어온 잡음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주희가 영욱의 손에서 떡을 절반쯤 떼어 자기 입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살살 씹어서 먹는 거야. 이 안 나가게 조심해. 오백 년 전엔 음식을 늘 씹어먹어야 해서 이가 손가락을 잘라버릴 수 있을 만큼 튼튼했대. 대단하지 않니?”
영욱은 적어도 독이 든 건 아니라는 데 안심하며 ‘떡’을 입에 넣어봤다. 그 순간 혀에 감기는 감칠맛과 포슬포슬하면서도 쫄깃하며 부드러운 식감에 놀라 눈이 커졌다.
“어머, 표정이 변하네? 느껴지니? 그게 맛이란 거야. 그렇구나, 정말 너도 맛을 느낄 줄 아는구나.”
영욱은 주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2013년에 단편소설 「전복」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급소』, 『사이드 미러』, 장편소설 『캐스팅』이 있으며 제23회 한무숙문학상을 받았다.
thekey-9@hanmail.net
고문헌연구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4 | 나만의 소울푸드 떡볶이! | 솔트 | 2022-07-07 |
| 3 | 지금 우리는 어떤 통제를 받고 있는가? | 조재민 | 2022-01-28 |
| 2 | 소울푸드 떡볶이를 사수하라 | ams | 2022-01-27 |
| 1 | 떡볶이가 먹고 싶은 날 | MrFunfair | 2021-11-05 |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