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고독한 순환을 즐기는 검은 유체 김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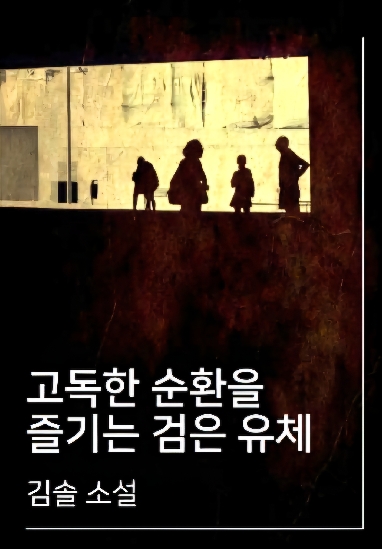
 HOME
HOME작가와 독자,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책 중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는 당연히 독자이고, 그 다음이 책이다.
작가는 당연히 자신의 책과 미지의 독자들에 대해서 말을 극도로 삼가야 한다.
그리고 나중엔 자신의 책에게도 침묵을 강제할 수 있다.
(독자에게) 말하지 않는 책과,
(책에 대해) 말하지 않는 작가에 간섭받지 않을 때
독자는 (책과 작가 따위에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독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작가는 책을 통해 엿듣는 사람에 불과하다.
가장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는 당연히 독자이고, 그 다음이 책이다.
작가는 당연히 자신의 책과 미지의 독자들에 대해서 말을 극도로 삼가야 한다.
그리고 나중엔 자신의 책에게도 침묵을 강제할 수 있다.
(독자에게) 말하지 않는 책과,
(책에 대해) 말하지 않는 작가에 간섭받지 않을 때
독자는 (책과 작가 따위에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독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작가는 책을 통해 엿듣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 책에 대해 소문을 듣거나 기적적으로 필사본을 직접 읽은 자들이라면 예외 없이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마르타 수녀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나 문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런 책을 쓰지 않았다. 2년 전 자신을 종교재판소로 불러들였던 첫 번째 책을 쓰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 거기서 얼음보다 더 단단하고 매끈한 표정을 유지한 채, 입술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펜을 쥔 손가락을 겨우 움직여서, 대주교가 들이민 종이 위에 “앞으로 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글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라고 썼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가 문맹이란 사실은 그녀의 부모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아차렸다면 그녀의 부모는 결코 딸을 수녀원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수천 권의 장서와 수백 가지의 악기와 기이한 천체관측 도구로 가득 찬 방에서 그녀가 혼자 지낼 수 있도록, 그녀의 후원자를 자처한 부왕까지 동원해 대주교의 허락을 받아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라틴어를 가르치지 않았건만 마태복음 첫 장을 술술 읽던 세 살짜리 소녀를 그녀의 부모는 똑똑히 기억한다. 딸의 멈추지 않는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주일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수녀원 도서관을 드나들 때만 하더라도 부모는 딸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았다.
제발 밤이 느리게 오기를, 제발 폭우가 너무 오래 이어지지 않기를, 제발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제발 양초의 심지가 오래 타지 않기를, 제발 초경이 빨리 찾아오기를, 그럴 수 없다면 제발 수녀원의 서고가 모두 불타길 그녀의 부모는 기도했다.
그때 거기서 얼음보다 더 단단하고 매끈한 표정을 유지한 채, 입술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펜을 쥔 손가락을 겨우 움직여서, 대주교가 들이민 종이 위에 “앞으로 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글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라고 썼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가 문맹이란 사실은 그녀의 부모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아차렸다면 그녀의 부모는 결코 딸을 수녀원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수천 권의 장서와 수백 가지의 악기와 기이한 천체관측 도구로 가득 찬 방에서 그녀가 혼자 지낼 수 있도록, 그녀의 후원자를 자처한 부왕까지 동원해 대주교의 허락을 받아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라틴어를 가르치지 않았건만 마태복음 첫 장을 술술 읽던 세 살짜리 소녀를 그녀의 부모는 똑똑히 기억한다. 딸의 멈추지 않는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주일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수녀원 도서관을 드나들 때만 하더라도 부모는 딸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았다.
제발 밤이 느리게 오기를, 제발 폭우가 너무 오래 이어지지 않기를, 제발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제발 양초의 심지가 오래 타지 않기를, 제발 초경이 빨리 찾아오기를, 그럴 수 없다면 제발 수녀원의 서고가 모두 불타길 그녀의 부모는 기도했다.
201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
소설집: 『암스테르담 가라지세일 두번째』 『살아남은 자들이 경험하는 방식』 『망상, 어語』 『유럽식 독서법』 『말하지 않는 책』,
장편소설: 『너도밤나무 바이러스』 『보편적 정신』 『마카로니 프로젝트』 『모든 곳에 존재하는 로마니의 황제 퀴에크』 『부다페스트 이야기』 『사랑의 위대한 승리일 뿐』 『행간을 걷다』
문지문학상, 김준성문학상, 젊은작가상 수상
nyxos@hanmail.net
말하지 않는 책 Libro Mudo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2 | 말하지 않는 책 | 키다리 | 2022-02-17 |
| 1 | 독자는 작가가 될 수 있을까 | 책물고기 | 2022-02-08 |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