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디에스 이라이 김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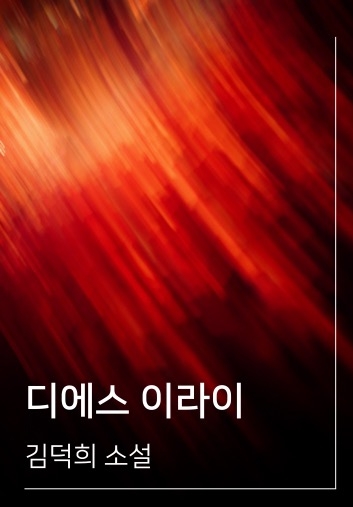
 HOME
HOME“나ᄒᆞᆯ 안디 붓ᄒᆞ리샤ᄃᆞᆫ 곶ᄒᆞᆯ 것가 받ᄌᆞ오리이다.”
천 년하고도 삼백 년쯤 더 전에 한 노인이 했다는 일종의 고백이다. “내가 아니 부끄러우시면 꽃을 꺾어 바치리다.” 암소를 끌고 가던 노인은 지극히 고귀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수로 부인에게 이 말을 건네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한 드라마의 대사 때문에 최근에 갑자기 유명해진 단어가 있다. 추앙(推仰). 높이 받들어 우러러본다는 뜻이다. 노인이 수로를 향했던 마음을 사랑보다는 추앙이라 생각하니 ‘헌화가’가 더 아름답게 읽혔다. 한 사람을 추앙하는 마음으로 절벽을 기어오르던 노인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썼다. 쓰는 일이 절벽을 기어오르는 일과 닮았다는 걸 새삼 느꼈다.
천 년하고도 삼백 년쯤 더 전에 한 노인이 했다는 일종의 고백이다. “내가 아니 부끄러우시면 꽃을 꺾어 바치리다.” 암소를 끌고 가던 노인은 지극히 고귀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수로 부인에게 이 말을 건네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한 드라마의 대사 때문에 최근에 갑자기 유명해진 단어가 있다. 추앙(推仰). 높이 받들어 우러러본다는 뜻이다. 노인이 수로를 향했던 마음을 사랑보다는 추앙이라 생각하니 ‘헌화가’가 더 아름답게 읽혔다. 한 사람을 추앙하는 마음으로 절벽을 기어오르던 노인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썼다. 쓰는 일이 절벽을 기어오르는 일과 닮았다는 걸 새삼 느꼈다.
어리둥절해서 서 있는 내게 그가 다가왔다. 나는 내가 놀란 것을 들키기 싫어 일부러 딴 곳을 쳐다보며 안 본 척했다. 그는 힘든 내색 없이 말했다.
이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줘 봐요. 애처럼 빈정대는 거 빼고요.
그는 내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너무 놀라 눈이 저절로 크게 떠졌다. 감히 내게 그런 식으로 날을 세우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당장 반격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조금 더듬거리기까지 했다.
뭐, 뭐라고요? 애처럼?
말해놓고 나니 더 황당하고 기가 찼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더한 말이라도 할 것 같았다. 겁이 났고, 회원을 이따위로 대하는 곳에 돈을 바쳐댄 내가 바보 같았다. 나는 다 관두기로 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버렸다.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는 등반복이며 슈즈를 죄 찢어버리고 싶었다.
그날 밤엔 ‘애처럼’이 밤새 귓가에 칭얼칭얼 울렸다. 침대에서 뒤척이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수십 번은 벌떡 일어나 앉았던 것 같다.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뭐라고 사람을 깔봐? 대표 좀 보자고 해야 되나?
무수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폭죽처럼 터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열고 홈페이지에 접속해보기도 했다. 관심을 구걸하는 블랙컨슈머따위는 되기 싫어서 다른 데서도 어지간하면 불만을 그냥 넘기고 다시는 찾지 않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이번은 그러기가 어려웠다. 나를 무슨 쓰레기 쳐다보듯 하던 그 눈빛이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다. 욕이라도 써갈겨놓고 싶었으나 홈페이지에는 이용자들이 글을 남길 만한 곳이 없었다.
이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줘 봐요. 애처럼 빈정대는 거 빼고요.
그는 내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너무 놀라 눈이 저절로 크게 떠졌다. 감히 내게 그런 식으로 날을 세우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당장 반격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조금 더듬거리기까지 했다.
뭐, 뭐라고요? 애처럼?
말해놓고 나니 더 황당하고 기가 찼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더한 말이라도 할 것 같았다. 겁이 났고, 회원을 이따위로 대하는 곳에 돈을 바쳐댄 내가 바보 같았다. 나는 다 관두기로 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버렸다.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는 등반복이며 슈즈를 죄 찢어버리고 싶었다.
그날 밤엔 ‘애처럼’이 밤새 귓가에 칭얼칭얼 울렸다. 침대에서 뒤척이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수십 번은 벌떡 일어나 앉았던 것 같다.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뭐라고 사람을 깔봐? 대표 좀 보자고 해야 되나?
무수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폭죽처럼 터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열고 홈페이지에 접속해보기도 했다. 관심을 구걸하는 블랙컨슈머따위는 되기 싫어서 다른 데서도 어지간하면 불만을 그냥 넘기고 다시는 찾지 않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이번은 그러기가 어려웠다. 나를 무슨 쓰레기 쳐다보듯 하던 그 눈빛이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다. 욕이라도 써갈겨놓고 싶었으나 홈페이지에는 이용자들이 글을 남길 만한 곳이 없었다.
2013년에 단편소설 「전복」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급소』, 『사이드 미러』, 장편소설 『캐스팅』이 있으며 제23회 한무숙문학상을 받았다.
thekey-9@hanmail.net
절벽의 노래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