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편피망록 장성욱

 HOME
HOME‘티셔츠’는 나의 소설 중에 ‘티셔츠’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매우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했다. 아니, 이유라기보다는 욕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 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애초에 시작점이 달랐으므로 결과물 역시 그동안의 내 소설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결국 아쉽게도 나의 첫 소설집에 함께하지 못했다. 그 점이 언제나 미안했는데 이 소설은 저 혼자 영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 지금은 이렇게 재차 발표의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 그런 꿋꿋한 모습이 소설 속 두 자매와도 닮아있어 내심 대견하기도 했다.
결국 소설은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별개의 운명체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나의 손에 있을 때 최대한 세심하게 보살피는 일일 것이다. 그래야만 다시 만났을 때도 미안하지 않을 테니까.
고마워. 잘 가, 또 보자.
결국 소설은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별개의 운명체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나의 손에 있을 때 최대한 세심하게 보살피는 일일 것이다. 그래야만 다시 만났을 때도 미안하지 않을 테니까.
고마워. 잘 가, 또 보자.
내 폰 있지?
텔레비전을 꺼달라는 부탁이 아닌 듯했다. 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휴대폰은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거기 돋보기 표시 눌러서 찾아보면 김부장이라고 있을 거야.
나는 언니의 말대로 김부장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찾았어.
전화를 걸어서 말 좀 전해줘.
내가? 열 신데.
괜찮아. 나는 못 할 것 같단 말이야.
뭐라고 해.
언니는 이제 회사 안 나간대. 개새끼야.
확실히 그런 내용이라면 밤 열 시에 말해도 괜찮을성싶었다.
진짜?
이대로 티셔츠 밖으로 나오면 다시 회사에 갈 것 같아서 그래.
언니는 이제 회사 안 나간대. 개새끼야?
응, 언니는 이제 회사 안 나간대. 개새끼야.
꼭 개새끼여야 해?
응 저스트 개새끼니까.
텔레비전을 꺼달라는 부탁이 아닌 듯했다. 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휴대폰은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거기 돋보기 표시 눌러서 찾아보면 김부장이라고 있을 거야.
나는 언니의 말대로 김부장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찾았어.
전화를 걸어서 말 좀 전해줘.
내가? 열 신데.
괜찮아. 나는 못 할 것 같단 말이야.
뭐라고 해.
언니는 이제 회사 안 나간대. 개새끼야.
확실히 그런 내용이라면 밤 열 시에 말해도 괜찮을성싶었다.
진짜?
이대로 티셔츠 밖으로 나오면 다시 회사에 갈 것 같아서 그래.
언니는 이제 회사 안 나간대. 개새끼야?
응, 언니는 이제 회사 안 나간대. 개새끼야.
꼭 개새끼여야 해?
응 저스트 개새끼니까.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2022년 소설집 『화해의 몸짓』
2024년 장편소설 『기억의 몫』
웹북 『티셔츠』『야마다 유우코의 마지막 어덜트 비디오』『피망록』 출간
lounnico@naver.com
티셔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3 | 새하얗고 베이직한, 티셔츠 혹은 소설 | 요제프k | 2024-06-29 |
| 2 | 그들이 향하는 곳 | 하얀바다 | 2024-05-20 |
| 1 | 티셔츠에 담긴 두 자매의 일상 판타지 | 해일 | 2024-05-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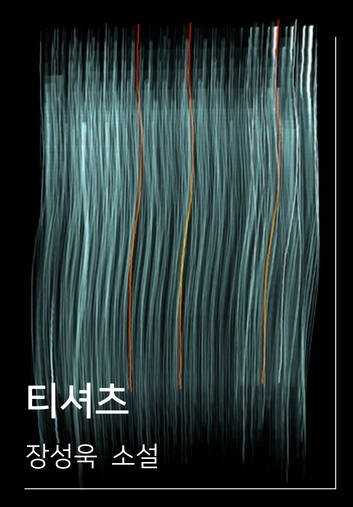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