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안함운다고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서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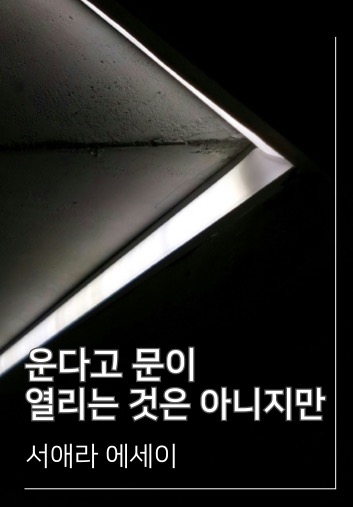
 HOME
HOME운다고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쓰기’에 대한 초보 작가의 마음을 담은 이 에세이는 지금의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독자로 가정하고 쓰기 시작했다. 뭐라도 써보려고 꿈틀대기 시작한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이 에세이를 써 가는 동안, 먼 훗날의 내가 이 글을 읽게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았다. 부질없는 고민들을 참 무겁게도 했었구나, 생각하겠지만 웃을 것 같았다. 미숙함과 진지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들은 마음을 간질거리게 하니까. 문해교실의 할머니들이나 종이접기를 하는 유치원생들이 그렇듯이. 어쩌면 이 글을 읽는 원로 작가분들 중에도 미래의 나처럼 웃는 분이 계실지 모른다. 누구든 조금이라도 미소 짓게 했으면 좋겠다.
에세이란, 쓰다가 느닷없이 부끄러움이 밀려드는 글이다. 이 글 속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인가? 이건 누군가? 그러다가 얼굴이 빨개지고 만다. 사실을 쓰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써도 사실을 사실대로만 쓸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고나 할까.
소설이라는 거짓말이 막힐 때는 에세이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에세이란, 쓰다가 느닷없이 부끄러움이 밀려드는 글이다. 이 글 속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인가? 이건 누군가? 그러다가 얼굴이 빨개지고 만다. 사실을 쓰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써도 사실을 사실대로만 쓸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고나 할까.
소설이라는 거짓말이 막힐 때는 에세이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해 겨울에 나는 일주일 간격으로 한 편, 세 편, 다섯 편씩 소설을 만들었다. 그렇게 속성으로 제작한 소설을 들고 우체국을 찾았다. 모조리 신춘에 투고했다. 자, 봐라. 너만큼이나 나도 내 입장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지성을 가졌다. 학벌도 돈도 없으니 몸뚱이와 시간밖에 없는 줄 아시겠지만, 나도 읽고 쓸 줄 안다. 애가 둘이나 딸려 있으니 투사가 될 수 없어 고개를 숙였지만, 허구의 틀을 빌려서라도 쏟아내야겠다.
씻을 시간도 없어서 봉두난발이 된 채로 우체국을 들락거렸더니, 하루는 우체국 직원이 내 핏발 선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작품 활동하느라 힘드신가 봐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보니 직원이 내 얼굴을 익혀 버린 것이었다. 신춘 응모를 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겉봉에 응모 부문을 크게 쓰게 되어 있다. 부끄러워서 이사를 갔다. 당연히 거짓말이다. 이사를 가긴 했는데, 부끄러워서는 아니었으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다행스러웠다. 계속 거기 살았으면 우체국 원정을 다녀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때의 글들은 재활용품도 못 되는 쓰레기였다. 쓰레기로 치면 환경 유해 물질 가득한 쓰레기쯤 되겠다. 그렇다고 그 글쓰기가 무용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를 통해 나는 가슴을 짓누르는 분노를 그나마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덜어낼 수 있었다.
후에 알고 보니, 정서적 격앙 상태에서 무지막지한 분량의 글을 써낸 경험을 한 사람이 내 생각만큼 희귀한 것은 아니었다. 이혼 직후 백몇십 편의 시를 써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연을 한 후에 틀어박혀 글만 썼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업에 실패하고 틀어박혀 소설을 쓴 사람도 있었다.
씻을 시간도 없어서 봉두난발이 된 채로 우체국을 들락거렸더니, 하루는 우체국 직원이 내 핏발 선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작품 활동하느라 힘드신가 봐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보니 직원이 내 얼굴을 익혀 버린 것이었다. 신춘 응모를 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겉봉에 응모 부문을 크게 쓰게 되어 있다. 부끄러워서 이사를 갔다. 당연히 거짓말이다. 이사를 가긴 했는데, 부끄러워서는 아니었으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다행스러웠다. 계속 거기 살았으면 우체국 원정을 다녀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때의 글들은 재활용품도 못 되는 쓰레기였다. 쓰레기로 치면 환경 유해 물질 가득한 쓰레기쯤 되겠다. 그렇다고 그 글쓰기가 무용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를 통해 나는 가슴을 짓누르는 분노를 그나마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덜어낼 수 있었다.
후에 알고 보니, 정서적 격앙 상태에서 무지막지한 분량의 글을 써낸 경험을 한 사람이 내 생각만큼 희귀한 것은 아니었다. 이혼 직후 백몇십 편의 시를 써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연을 한 후에 틀어박혀 글만 썼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업에 실패하고 틀어박혀 소설을 쓴 사람도 있었다.
2022년 현진건 신인문학상 당선
2024 종이책『소설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공저) 출간
웹북 『엄마의 이름은 반다』 『당신이 잠든 동안』 『운다고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출간
운다고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