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인류 최후 증언자의 마지막 쇼타임 박은비

 HOME
HOME창(槍) : 2024-1 당선작
이 세계의 규칙에 따라 내 몸에는 커다란 창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후유증은 해결되지 못한 채 반평생 정도가 흘렀다.
나에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 창이 꽂혀 있는, 모두가 그걸 알면서 모른 척하는, 무관심하고 절망적인 세계 속에 주인공을 내세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려보았다.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다. 주인공의 몸에는 앞으로도 창이 계속 박힐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주인공은 이미 느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나에게 동화였다. 앞으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가 닿을지는 모르겠다. 내 곁을 떠난 이 세계가 마침내 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벅차다. 어떤 여정을 겪게 되든 기꺼운 마음이길 바란다.
당선 연락을 받고 한동안 만감이 교차했다. 이게 무슨 기분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기분이라기보단 상태에 가까운 것 같다. 텅 비워낸 상태. 항상 쓸데없는 집착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들여다보며 생각한다. 먹고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싸한 직장인도 되지 못한 나. 그렇다고 세상이 주목하는 천재도 아닌 나. 결국 여기까지 버틴 나. 위로하기도 좀 그렇고 나무라기도 좀 그래서 습관처럼 펜을 잡는다.
창은 이제 뽑혔고, 남은 건 써야 할 글뿐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은 결국 펜을 향할 것이다.
묵은 창을 뽑고 닫혀있던 말문을 열어주신 모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온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나에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 창이 꽂혀 있는, 모두가 그걸 알면서 모른 척하는, 무관심하고 절망적인 세계 속에 주인공을 내세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려보았다.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다. 주인공의 몸에는 앞으로도 창이 계속 박힐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주인공은 이미 느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나에게 동화였다. 앞으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가 닿을지는 모르겠다. 내 곁을 떠난 이 세계가 마침내 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벅차다. 어떤 여정을 겪게 되든 기꺼운 마음이길 바란다.
당선 연락을 받고 한동안 만감이 교차했다. 이게 무슨 기분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기분이라기보단 상태에 가까운 것 같다. 텅 비워낸 상태. 항상 쓸데없는 집착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들여다보며 생각한다. 먹고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싸한 직장인도 되지 못한 나. 그렇다고 세상이 주목하는 천재도 아닌 나. 결국 여기까지 버틴 나. 위로하기도 좀 그렇고 나무라기도 좀 그래서 습관처럼 펜을 잡는다.
창은 이제 뽑혔고, 남은 건 써야 할 글뿐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은 결국 펜을 향할 것이다.
묵은 창을 뽑고 닫혀있던 말문을 열어주신 모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온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 여자는 첫 모습부터 심상치 않았다.
그녀가 처음 면사무소에 들어왔던 날을 기억한다. 밖에는 비가 내렸고, 건물 안은 습했고, 유난히 사람들의 신경질로 실내가 북새통을 이루었던 날. 등본 떼러 올 때마다 무인 발급기를 욕하며 쓸데없는 것에 내 세금을 낭비하네, 이 나라는 노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네, 내게 가늘고 뾰족한 창을 던져대는 배 씨 할아버지에게 유독 시달리던 날이었다.
점심시간 직전, 그녀는 조용히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기억하기 쉬웠던 이유는, 머리를 제외한 온몸에 창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저 정도의 상태라면 몸을 가누는 것도, 숨을 쉬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들 정도의 통증을 느낄 텐데, 정작 그녀의 표정은 고통 하나 침범하지 못한 듯 평온해 보였다.
나는 그녀가 내게로 오지 않기를 바랐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전이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순번이 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러 왔다고 했다. 나는 절차대로 신분증을 받아 그녀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신고서를 내밀며 작성해달라고 했다.
“좀 많네요.”
처음에는 그녀가 사망신고 절차에 대해 지적하는 줄 알았다. 작성할 게 그렇게 많다고 느껴졌나?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오늘따라 시시콜콜한 걸로 시비 거는 인간들이 많이 온다 했더니, 정말 환장하겠네.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가기는 글렀나 보다.
나는 그녀의 관상이 얼마나 악성 민원인에 가까운지, 그동안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가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펜을 내려놓았을 때, 그녀가 몸에 무수히 꽂힌 창 하나를 뽑아서 내게로 던질까 봐 나는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달리 그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 창은 참을 만해요. 익숙해졌거든요.”
그녀가 처음 면사무소에 들어왔던 날을 기억한다. 밖에는 비가 내렸고, 건물 안은 습했고, 유난히 사람들의 신경질로 실내가 북새통을 이루었던 날. 등본 떼러 올 때마다 무인 발급기를 욕하며 쓸데없는 것에 내 세금을 낭비하네, 이 나라는 노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네, 내게 가늘고 뾰족한 창을 던져대는 배 씨 할아버지에게 유독 시달리던 날이었다.
점심시간 직전, 그녀는 조용히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기억하기 쉬웠던 이유는, 머리를 제외한 온몸에 창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저 정도의 상태라면 몸을 가누는 것도, 숨을 쉬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들 정도의 통증을 느낄 텐데, 정작 그녀의 표정은 고통 하나 침범하지 못한 듯 평온해 보였다.
나는 그녀가 내게로 오지 않기를 바랐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전이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순번이 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러 왔다고 했다. 나는 절차대로 신분증을 받아 그녀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신고서를 내밀며 작성해달라고 했다.
“좀 많네요.”
처음에는 그녀가 사망신고 절차에 대해 지적하는 줄 알았다. 작성할 게 그렇게 많다고 느껴졌나?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오늘따라 시시콜콜한 걸로 시비 거는 인간들이 많이 온다 했더니, 정말 환장하겠네.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가기는 글렀나 보다.
나는 그녀의 관상이 얼마나 악성 민원인에 가까운지, 그동안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가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펜을 내려놓았을 때, 그녀가 몸에 무수히 꽂힌 창 하나를 뽑아서 내게로 던질까 봐 나는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달리 그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 창은 참을 만해요. 익숙해졌거든요.”
2020년 제2회 장수문학상 본상 수상
2024-1 스토리코스모스 신인소설상 당선
웹북 『창(槍)』 『동제(洞祭)』『아직 아닐 거라는 착각』『조립 가족』 출간
revan_06@naver.com
창(槍)
심사평
심사평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4 | 발상의 전환 | 구름 | 2024-12-04 |
| 3 | 가슴 뭉클한 소설이었습니다. | 배재연 | 2024-09-16 |
| 2 | 첫 문장부터 나는 찔렸다 | 솔트 | 2024-04-08 |
| 1 | 편안함 | 큰악새 | 2024-03-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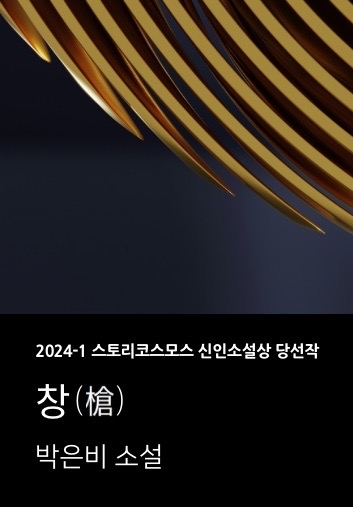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