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다시 흐른다 이밤

 HOME
HOME최근 나는 초연을 앞둔 한 뮤지컬에 스텝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대단한 일인가 하면 물론 아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는 거라곤
1.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하루쯤 나 대신 보릿자루를 갖다 놓는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2.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가운데(극장에 있는 동안 눈이 열 번쯤 먼다)
3. 심장을 쿵쿵 두드리는 록밴드의 사운드를 느끼며(밤이 되면 이명이 들리기 시작한다)
4. 목청 좋고 잘생긴 배우들이 연기와 가무를 뽐내는 것을 구경한다(R석의 가격은 7만 7천 원, 나는 벌써 100만 원쯤은 번 셈이다).
셋업 동안 한 편의 극이 완성된 꼴을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경이로웠다. 연출자와 배우들은 물론 무대, 의상, 음향, 음악, 안무, 조명, 영상까지…… 수많은 관계자가 모여 지난하고 다번한 협업의 과정을 거친 끝에야 비로소 결과물이 나온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이지 경이롭다.
지켜보기만 해도 진이 쏙 빠지는 이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글만 쓰길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나는 거대 자본의 힘을 빌려 남의 돈으로 예술을 하지 않는다. 그건 곧 눈칫밥을 먹을 필요도, 망해서 모두를 길바닥에 나앉게 한다는 악몽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최초의 각본가로서, 협업을 거부하는 연출가로서, 다중의 배우로서, 그리하여 유일한 관계자로서의 소설가로 기능한다. 백지 앞에서의 야심만 가지면 되는 일이란 제법 간단하고 멋지다.
이 이야기는 그러한 야망에서 나온 귀여운 소동극騷動劇이다. 새로운 장이 열릴 때마다 나타나는 인물들을 한동안 많이 아꼈다. 이제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낸다.
1.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하루쯤 나 대신 보릿자루를 갖다 놓는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2.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가운데(극장에 있는 동안 눈이 열 번쯤 먼다)
3. 심장을 쿵쿵 두드리는 록밴드의 사운드를 느끼며(밤이 되면 이명이 들리기 시작한다)
4. 목청 좋고 잘생긴 배우들이 연기와 가무를 뽐내는 것을 구경한다(R석의 가격은 7만 7천 원, 나는 벌써 100만 원쯤은 번 셈이다).
셋업 동안 한 편의 극이 완성된 꼴을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경이로웠다. 연출자와 배우들은 물론 무대, 의상, 음향, 음악, 안무, 조명, 영상까지…… 수많은 관계자가 모여 지난하고 다번한 협업의 과정을 거친 끝에야 비로소 결과물이 나온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이지 경이롭다.
지켜보기만 해도 진이 쏙 빠지는 이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글만 쓰길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나는 거대 자본의 힘을 빌려 남의 돈으로 예술을 하지 않는다. 그건 곧 눈칫밥을 먹을 필요도, 망해서 모두를 길바닥에 나앉게 한다는 악몽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최초의 각본가로서, 협업을 거부하는 연출가로서, 다중의 배우로서, 그리하여 유일한 관계자로서의 소설가로 기능한다. 백지 앞에서의 야심만 가지면 되는 일이란 제법 간단하고 멋지다.
이 이야기는 그러한 야망에서 나온 귀여운 소동극騷動劇이다. 새로운 장이 열릴 때마다 나타나는 인물들을 한동안 많이 아꼈다. 이제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낸다.
만삭의 임산부를 두고 아버지는 도망갔다. 야반도주였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엄마는 휑한 침대 옆자리를 보며 갈 것이 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나에게 전했다. 협탁 위엔 아버지가 남긴 쪽지가 놓여 있었다.
타박타박 걸어왔어. 사뿐사뿐 떠날 거야.
여배우로서 막 꽃봉오리를 틔우려던 순간 제 손으로 줄기를 꺾어버린 엄마였다. 허랑방탕한 남자와 허튼 사랑에 빠져 인생 2막을 꾀한 대가는 혹독했다. 졸지에 과부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그녀는 생활력이라곤 쥐며느리만큼도 없는 여자였다. 근근이 도움을 주던 시댁조차 머지않아 아들을 없는 놈 취급하며 원조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내 머리가 굵어가는 동안 남편을 명명하는 그녀의 호칭은 그 양반, 웬수 같은 놈, 개만도 못한 새끼 등으로 과격하게 변모했다. 엄마는 종종 27인치 LED 모니터 한가득 아버지 사진을 띄워 내게 보여주곤 했다.
이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렴.
다정한 어조에 그렇지 못한 표정으로 그녀는 심상하게 덧붙였다.
살다가 어디서든 만나거든, 일단 면상부터 후려쳐라.
타박타박 걸어왔어. 사뿐사뿐 떠날 거야.
여배우로서 막 꽃봉오리를 틔우려던 순간 제 손으로 줄기를 꺾어버린 엄마였다. 허랑방탕한 남자와 허튼 사랑에 빠져 인생 2막을 꾀한 대가는 혹독했다. 졸지에 과부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그녀는 생활력이라곤 쥐며느리만큼도 없는 여자였다. 근근이 도움을 주던 시댁조차 머지않아 아들을 없는 놈 취급하며 원조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내 머리가 굵어가는 동안 남편을 명명하는 그녀의 호칭은 그 양반, 웬수 같은 놈, 개만도 못한 새끼 등으로 과격하게 변모했다. 엄마는 종종 27인치 LED 모니터 한가득 아버지 사진을 띄워 내게 보여주곤 했다.
이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렴.
다정한 어조에 그렇지 못한 표정으로 그녀는 심상하게 덧붙였다.
살다가 어디서든 만나거든, 일단 면상부터 후려쳐라.
2022-2 스토리코스모스 신인소설상 당선
2024 종이책『소설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공저) 출간
웹북 『초대』 『사랑이 망하고 남은 것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다시 흐른다』출간
nachtbruised@naver.com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다시 흐른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2 | 애증의 소동극 | minimum | 2024-11-24 |
| 1 | 폴리포니를 느끼게 하는 유쾌한 소동극 | 책물고기 | 2024-10-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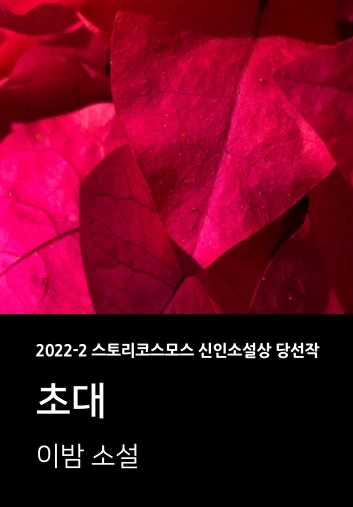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