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하나의 중얼거림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 이아타

 HOME
HOME하나의 중얼거림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려 본 사람은 ‘중얼거림’의 뒤끝이 쓸쓸하고 허무하다는 걸 안다. 술 먹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잔뜩 마시고 일어난 아침에 느끼는 기분과 흡사하다. 평범하고 싶은 우리, 그저 남들처럼 살고 싶은 우리, 그러나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 우리는 맨홀 구멍처럼 소원하고 불안하다.
세계의 모든 것이, 사람과 인정(人情)과 오물과 쓰레기까지 화폐와 자본으로 빨려들어가는 시대에 개인의 낮은 중얼거림마저 자본 시스템에 흡수된다는 상상으로 글을 시작했다. 쓰면서 중얼거림의 더 아래층에 쌓여 있을 한숨, 분노, 슬픔, 허무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다.
중얼거려야 하는 사람에게 물음표를 달고 사람들의 소곤거림에 느낌표를 느끼게 된다면, 글을 쓴 사람으로선 더 바랄 게 없을 듯하다. 우라질 세상에 중얼거림은 독야청청해야 하지 않을까. 하물며 소설도 낮은 중얼거림에서 솟아나는데.
세계의 모든 것이, 사람과 인정(人情)과 오물과 쓰레기까지 화폐와 자본으로 빨려들어가는 시대에 개인의 낮은 중얼거림마저 자본 시스템에 흡수된다는 상상으로 글을 시작했다. 쓰면서 중얼거림의 더 아래층에 쌓여 있을 한숨, 분노, 슬픔, 허무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다.
중얼거려야 하는 사람에게 물음표를 달고 사람들의 소곤거림에 느낌표를 느끼게 된다면, 글을 쓴 사람으로선 더 바랄 게 없을 듯하다. 우라질 세상에 중얼거림은 독야청청해야 하지 않을까. 하물며 소설도 낮은 중얼거림에서 솟아나는데.
마트에서 실어 온 물건들을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낑낑대며 올려와서는 마눌이 지시한 대로 분류해서 다용도실로 냉장고로 베란다로 가져다 놓았다.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도 온몸에 힘이 죽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 사이 마눌은 샤워하러 들어가 버렸다.
매주 마트에 다녀오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또 그걸 분류하면서 마치 그녀가 이런 걸 시키려고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녀는 청소도 요리도 하지 않고 더욱이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출산과 양육 모두를 질색했다. 원한다면 입양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양육은 전적으로 밥이 책임진다는 전제하에서였다.
그녀에게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건 한마디로 구닥다리였다. 게다가 이미 한물간 복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김빠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침대에서 흥분하고 발기해 있던 밥은 마눌의 그 말을 듣자마자 압력밥솥 김이 빠지듯 성기 끝에서 피이- 하고 열기가 새 나가는 것을 느꼈다.
밥은 저도 모르게 ‘아, 피곤해’하고 다시 중얼거렸다. 그가 씻고 나오자 마눌이 즉석 음식과 냉동식품으로 상을 차려 놓았다. 전자레인지로 데워진 냄비에서 끈적한 국물이 하얀 식탁보로 흘렀으나 배가 고팠으므로 모른 척했다. 늦은 저녁 식사였다. 식기세척기가 작동하는 사이 아내와 밥은 번갈아 양치질했다. 밥은 세척된 그릇을 제자리에 두고 문단속을 했다.
침실에서 마눌은 야릇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의 몸속으로 들어갈 때면 밥은 이따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어찌어찌 몸이 달아오르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마눌의 새된 소리에 힘을 내다가 밥은 절정의 순간에 곧바로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 지금은 마눌이 피임을 하고 있기도 했지만 신혼 때부터 길든 버릇이었다. 나름 재빨리 움직여도 아내의 거웃이나 그의 허벅지엔 미지근한 정액이 한줄기 흘러내리곤 했다. 포장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비닐랩 바깥으로 끈적끈적하고 미지근한 국물이 흐르듯.
매주 마트에 다녀오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또 그걸 분류하면서 마치 그녀가 이런 걸 시키려고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녀는 청소도 요리도 하지 않고 더욱이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출산과 양육 모두를 질색했다. 원한다면 입양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양육은 전적으로 밥이 책임진다는 전제하에서였다.
그녀에게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건 한마디로 구닥다리였다. 게다가 이미 한물간 복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김빠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침대에서 흥분하고 발기해 있던 밥은 마눌의 그 말을 듣자마자 압력밥솥 김이 빠지듯 성기 끝에서 피이- 하고 열기가 새 나가는 것을 느꼈다.
밥은 저도 모르게 ‘아, 피곤해’하고 다시 중얼거렸다. 그가 씻고 나오자 마눌이 즉석 음식과 냉동식품으로 상을 차려 놓았다. 전자레인지로 데워진 냄비에서 끈적한 국물이 하얀 식탁보로 흘렀으나 배가 고팠으므로 모른 척했다. 늦은 저녁 식사였다. 식기세척기가 작동하는 사이 아내와 밥은 번갈아 양치질했다. 밥은 세척된 그릇을 제자리에 두고 문단속을 했다.
침실에서 마눌은 야릇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의 몸속으로 들어갈 때면 밥은 이따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어찌어찌 몸이 달아오르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마눌의 새된 소리에 힘을 내다가 밥은 절정의 순간에 곧바로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 지금은 마눌이 피임을 하고 있기도 했지만 신혼 때부터 길든 버릇이었다. 나름 재빨리 움직여도 아내의 거웃이나 그의 허벅지엔 미지근한 정액이 한줄기 흘러내리곤 했다. 포장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비닐랩 바깥으로 끈적끈적하고 미지근한 국물이 흐르듯.
2010년 계간 『작가세계』 신인상 당선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진 스토리작가 공모 당선, SF소설 『베이츠』 출간
2016년 소설집 『월요일의 게이트볼』
2020년 소설집 『사월에 내리는 눈』
2024년 장편소설 『가난한 사랑의 미래』
심훈 문학상, 현진건 문학상 우수상 수상
miroo35@hanmail.net
하나의 중얼거림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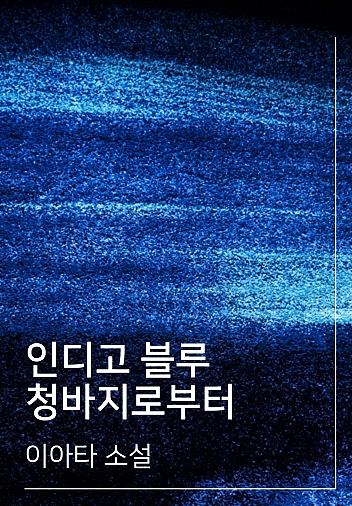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