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잠깐 다녀올게: 2024 수상작가 자선작 김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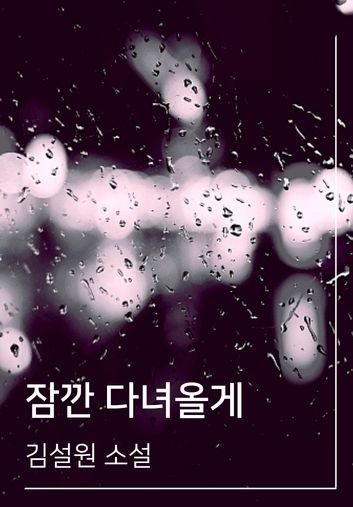
 HOME
HOME팔월극장: 2024 현진건문학상
「팔월극장」은 영화를 만들고, 또 소설을 쓰고 싶은 영진과 윤희의 이야기다. 하지만 그녀들은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수시로 무릎이 꺾이거나, 그 꿈을 당분간 등 뒤에 놓아둔다. 사실 이 작품에서 소설가를 꿈꾸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인물은 바로 작가인 나다. 윤희와 영진이는 어떤 면에서 내 분신이다.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애착이 가는, 아픈 손가락이나 다름없는 소설이다. 가정환경 때문에 억척스러워진, 머지않아 막이 오를 ‘팔월극장’ 같은 꿈을 가슴에 품고 부박한 현실에 맞서는 윤희 곁에서 부디 영진이가 삶의 방향을 찾길 바란다.
나는 두 개의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며 즐거이, 때론 우울하게 노를 젓고 있다. 직장에서는 ‘김수진’으로, 문우들 사이에서는 ‘김설원’으로 불린다. 일과 문학을 양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어지기 마련이지만 아무쪼록 균형을 잘 유지해서 ‘삶에 뿌리를 내린, 읽어서 즐거운’ 소설을 써보자고 스스로를 격려한다.
나는 두 개의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며 즐거이, 때론 우울하게 노를 젓고 있다. 직장에서는 ‘김수진’으로, 문우들 사이에서는 ‘김설원’으로 불린다. 일과 문학을 양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어지기 마련이지만 아무쪼록 균형을 잘 유지해서 ‘삶에 뿌리를 내린, 읽어서 즐거운’ 소설을 써보자고 스스로를 격려한다.
샐러리맨에게 가려면 공용 화장실을 지나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 일정한 모양으로 차곡차곡 놓여 있는 나무 계단을 보고 있자니, 너는 이 계단의 수만큼 살았다고, 누군가가 말해주는 듯했다.
샐러리맨은 팔베개를 한 채 벤치에 드러누워 있었다. 너무나 피곤하다는 듯 혀를 쑥 내민 얼굴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측은했다. 넥타이가 반으로 접혀 가슴께에 늘어져 있었다. 구두는 벗어 던졌다. 왼쪽 무릎에 오른쪽 다리를 걸친 그의 머리맡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바지 주름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했다.
언뜻 보면 실제 샐러리맨이 누워 있는 것 같은 조형물이었다. 샐러리맨에 대한 정보는 없다. 기본적으로 알려주기 마련인 제목, 제작자, 제작 연도 따위를 감춰버렸다. 한마디로 속을 알 수 없는 남자였다. 샐러리맨의 현재 처지를 상상해 보라는 뜻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미혼인지 기혼인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지쳐 있는지…… 그의 일상을 그려보며 유대감 내지는 교감을 나누라는 주문. 아니면 누구든 세상살이가 버겁다는, 너만 쓸쓸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는 무언의 위로.
나는 샐러리맨의 양복 자락을 깔고 앉았다. 벤치의 폭은 넓었다. 제작자가 일부러 샐러리맨 옆에 누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배낭을 한쪽에 놓은 뒤 운동화를 벗고 샐러리맨 옆에 누웠다. 직각으로 구부러진 샐러리맨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커다란 고깔 모양의 하늘이 나뭇가지 사이로 보였다. 저 삼각형의 공간으로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빛의 입자가 하염없이 스며들고, 그 마법 같은 기운을 받아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되는 상상하다 보면 졸음이 밀려왔다. 나는 모로 누워 샐러리맨의 해쓱한 구릿빛 얼굴을 쓰다듬었다. 넥타이도 매만졌다. 샐러리맨의 반쯤 내민 혀에서 휴-,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딸기 먹을래요?”
나는 배낭을 흘깃 쳐다보며 샐러리맨에게 물었다.
“오면서 마트에 들렀어요. 껌이랑 티슈를 사려고요. 마트에서 나와 천천히 걷는데 배낭이 묵직한 거예요. 이상하다, 뭘 많이 넣지도 않았는데…… 배낭을 열어보니까, 나 참, 딸기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딸기를 샀지 뭐예요.”
샐러리맨은 팔베개를 한 채 벤치에 드러누워 있었다. 너무나 피곤하다는 듯 혀를 쑥 내민 얼굴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측은했다. 넥타이가 반으로 접혀 가슴께에 늘어져 있었다. 구두는 벗어 던졌다. 왼쪽 무릎에 오른쪽 다리를 걸친 그의 머리맡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바지 주름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했다.
언뜻 보면 실제 샐러리맨이 누워 있는 것 같은 조형물이었다. 샐러리맨에 대한 정보는 없다. 기본적으로 알려주기 마련인 제목, 제작자, 제작 연도 따위를 감춰버렸다. 한마디로 속을 알 수 없는 남자였다. 샐러리맨의 현재 처지를 상상해 보라는 뜻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미혼인지 기혼인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지쳐 있는지…… 그의 일상을 그려보며 유대감 내지는 교감을 나누라는 주문. 아니면 누구든 세상살이가 버겁다는, 너만 쓸쓸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는 무언의 위로.
나는 샐러리맨의 양복 자락을 깔고 앉았다. 벤치의 폭은 넓었다. 제작자가 일부러 샐러리맨 옆에 누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배낭을 한쪽에 놓은 뒤 운동화를 벗고 샐러리맨 옆에 누웠다. 직각으로 구부러진 샐러리맨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커다란 고깔 모양의 하늘이 나뭇가지 사이로 보였다. 저 삼각형의 공간으로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빛의 입자가 하염없이 스며들고, 그 마법 같은 기운을 받아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되는 상상하다 보면 졸음이 밀려왔다. 나는 모로 누워 샐러리맨의 해쓱한 구릿빛 얼굴을 쓰다듬었다. 넥타이도 매만졌다. 샐러리맨의 반쯤 내민 혀에서 휴-,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딸기 먹을래요?”
나는 배낭을 흘깃 쳐다보며 샐러리맨에게 물었다.
“오면서 마트에 들렀어요. 껌이랑 티슈를 사려고요. 마트에서 나와 천천히 걷는데 배낭이 묵직한 거예요. 이상하다, 뭘 많이 넣지도 않았는데…… 배낭을 열어보니까, 나 참, 딸기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딸기를 샀지 뭐예요.”
2002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은빛지렁이」 당선
2009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 당선
2019년 제12회 창비장편소설상 수상
2024년 제16회 현진건문학상 수상
팔월극장: 2024 현진건문학상 수상작
심사평
심사평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2 | 한 편의 극처럼 완성된 청춘 | 구름 | 2025-01-13 |
| 1 | 한 편의 영화로 읽는 팔월극장 | 솔트 | 2024-11-12 |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