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편오이도, 그립거나 막막하거나 김설원


 HOME
HOME서울시민이었을 때 딱 한 번 오이도에 갔다. 남편을 조용히 ‘버리고’ 싶어 하는 여자들과 수다를 떨다 얼떨결에 휩쓸린 나들이였다. 날씨는 우중충했고, 맥주에 곁들여 먹은 조개구이는 썼다. 웬일인지 생의 거대한 나침반 같던 빨간등대로만 자꾸 눈길이 갔다. 물론 그녀들은 여전히 남편과 잘살고 있다.
작년 연말 즈음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마늘을 깠다. 알싸한 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때 친구가 TV에 대고 “자기야, 티브이 틀어줘”라고 말했다. 작동되지 않았다. 다시 청했다, 티브이 틀어달라고. 그랬더니 음성 비서가 하는 말 “저는 님의 자기가 아닙니다”. 순간 그 한 문장이 내 머리를 휘감았다.
빨간등대
저는 님의 자기가 아닙니다
이 두 재료로 어떤 소설의 집을 지을까. 밤낮 설계도를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다 ‘김보록’이 태어났다. 서른이 넘어서까지 젖병에 분유를 타서 쪽쪽 빨아먹는 남자.
작년 연말 즈음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마늘을 깠다. 알싸한 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때 친구가 TV에 대고 “자기야, 티브이 틀어줘”라고 말했다. 작동되지 않았다. 다시 청했다, 티브이 틀어달라고. 그랬더니 음성 비서가 하는 말 “저는 님의 자기가 아닙니다”. 순간 그 한 문장이 내 머리를 휘감았다.
빨간등대
저는 님의 자기가 아닙니다
이 두 재료로 어떤 소설의 집을 지을까. 밤낮 설계도를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다 ‘김보록’이 태어났다. 서른이 넘어서까지 젖병에 분유를 타서 쪽쪽 빨아먹는 남자.
중학생 누나가 처음으로 데려간 바다여서 오이도는 특별했다. 화목한 가족의 첫 여행지처럼. 그 추억은 진귀한 골동품 같아 시간이 흐를수록 색다른 빛이 났다. 그 뒤로는 혼자 오이도에 갔다. 스무 살 때부터 이어진 발길이었다.
그립거나, 막막하거나.
둘 중 한 감정일 때 오이도로 향했다. 막막한 쪽이 훨씬 많았다. 애초부터 가족이란 외투를 입지 않고 뛰어든 삶의 정글에선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체구까지 작아 더욱 불리했다. 막막한 이유는 분명했으나 그리움의 실체는 또렷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엄마도, 어떤 날은 누나의 얼굴까지도 흐리마리했다. 막막한 감정보다 그리움의 대상이 불분명하단 사실이 더 구슬펐다.
그립거나, 막막하거나.
둘 중 한 감정일 때 오이도로 향했다. 막막한 쪽이 훨씬 많았다. 애초부터 가족이란 외투를 입지 않고 뛰어든 삶의 정글에선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체구까지 작아 더욱 불리했다. 막막한 이유는 분명했으나 그리움의 실체는 또렷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엄마도, 어떤 날은 누나의 얼굴까지도 흐리마리했다. 막막한 감정보다 그리움의 대상이 불분명하단 사실이 더 구슬펐다.
2002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은빛지렁이」 당선
2009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 당선
2019년 제12회 창비장편소설상 수상
2024년 제16회 현진건문학상 수상
오이도, 그립거나 막막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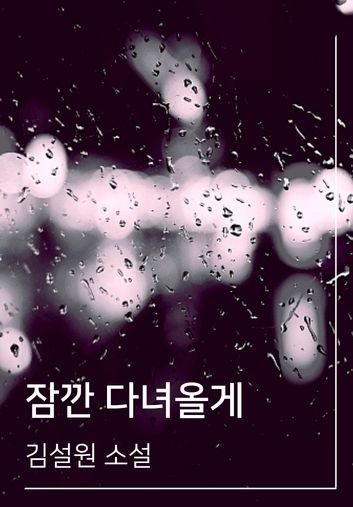

총 개